- ● homepage
- ● archives
- ● restoration
- ● books
- ● big banners
- ● post board
- ■ neo's search
- ■ about us
- ■ 게재방법 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email protected]
- Tel. 02_335_7922
- Fax. 02_335_7929
- 10:00am~04:30pm
- 월요일~금요일
- 3/3(월) 대체공휴일

어둠은 머금던 빛을 피운다
-아모르 파티amor fati cf. 허송세월虛送歲月- The dark blooms the light kept -amor fati cf. idle one’s time away-
이종미展 / BELL LEE / 李鐘美 / painting.installation 2024_1113 ▶ 2024_1118
●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네오룩 아카이브 Vol.20230706e | 이종미展으로 갑니다.
이종미 블로그_blog.naver.com/jongmeelee
초대일시 / 2024_1113_수요일_05:00pm
관람시간 / 10:30am~06:00pm
갤러리밈 GALLERY MEME 서울 종로구 인사동5길 3 Tel. +82.(0)2.733.8877 www.gallerymeme.com
사랑에서 내가 비롯된다.

- 이종미_바라보다 空 네 번째 사진_2024_원본_먼지, 유화용오일, 캔버스_91×91cm_2018~
긍정과 수용의 태도를 짜내며 지낸 삶을 허송세월이라 퉁 친다면 왠지 형용모순 같지 않은가? 허전함과 무기력을 배태한 시간의 무능력 속에 사는 듯이 사는, 경사길 틈새 빠져 공회전하는 바퀴 한 쌍에 올라탄 바퀴벌레라고, 언어유희까지도 겨우 그것으로밖에는 떠올릴 수 없음을 못 마땅해하는 한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뒤틀린 '나''들'의 모습이다.

- 이종미_무無+_먼지, 유화용 오일, 파스텔, 캔버스_100×100cm_2024
때론 위트일 수도 있고 복선이거나 감춤이기도 하다. 미완의 정의를 품은 '예술 같은 예술'을 세상에 내놓는다. 삶과 예술을 유비類比하면 미술은 상상 속에서 완전한 개체가 된다. 타자로서의 예술은 언어적으로 소통되기 어려운 착상을 함의한다. 개념을 상상하는 일이기도. 예술을 온전한 존재로 상정하는 상상은 개념이 생명을 가진 몸이란 말처럼 시적詩的이다. 이는 사회와 연결된 예술 스스로의 입장을 절단하는 것과 같다. 사회와의 불통不通이 예상되는 허무함이다. 다시 한번 그래서 작업과 나는 두 존재이다. 나는 나의 또 다른 타자로서 캔버스의 역사를 믿는다. 믿고 보니 '나'를 다 모르듯 예술 또한 알 수 없다. 예술은 무無의 침묵이다. 작업 내용은 예술 따라 무無이며 캔버스는 무無의 몸이다.

- 이종미_무無+_먼지, 유화용 오일, 파스텔, 캔버스_100×100cm_2024
무無는 부정이 아니다. 무無는 온 힘을 다해 긍정하는 에너지이다. 마치 물질을 희석하는 장치 같아 존재자는 무無를 통과하면 순도 높게 달라져 지녔던 이름을 잃는다. 채도와 명도가 높아진 이를 사람에 비유하면 꽁한 마음의 옹이가 숱한 손때 흔적으로 낡고 닳아 무수한 사건을 포용해버린 상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무無의 표면은 단단하지 않고 오히려 물컹거린다. 그렇다고 흘러 형태를 유지 못 할 정도는 아니고 모난 데 없이 두루 곡선의 상태를 유지해 보기엔 구에 가까운 형태이다. 마음의 식도를 따라 들어가면 종유석 같은 모양이 좁고 길게 한없이 뚫려있는데 그 끝자락 즈음 가면 어둠이 마치 물질처럼 질량감 있게 드러난다. 그곳도 무無다. 눈을 뜨고 몸 안의 무無를 느끼면 전자와 같고 눈을 감고 무無를 감각 하면 후자와 같다.

- 이종미_37도16.7440'N 127도30.8260E 2024.5.1.~5.5_사진_가변크기_2024_부분
무無를 그림에서 유화용 오일oil로 상상한다. 회화를 캔버스 면에 안료를 접착시키는 행위라고 볼 때, 면과 안료의 매개체인 오일은 그림이 되어가는 물리구조의 중요한 관계에 놓인다. 무無는 당하는 사태, 사건과 더불어 흔들리고 휩쓸리는 존재의 현상을 담는다. 무無는 물리적 몸을 넘어 무한의 공간을 신체적으로 체험하게도 하는데 바로 그때 그림은 타자, '그것'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 회화의 민낯이 드러나는 시공간이다. ● 무無는 자신이 머무는 장소의 흔적을 먼지로 드러낸다. 무無(화)된 그림은 언어의 그물에 걸리지 않거나 언어 이전에 머무는 존재의 뉘앙스를 담아낸다. 그림일 수 있는 조건을 간신히 갖추고 스스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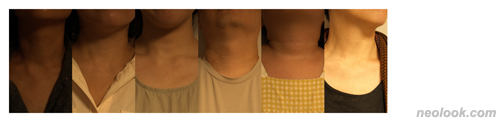
- 이종미_20144160850 수집 세월호_사진_가변크기_2024
존재하지 않는 언어, 어둠으로 향하는 인식의 건너뜀은 상상력으로 현실 인식을 극복하려는 마음의 의지이다. 감각 없는, 있는 그대로의 고통은 인식의 붙잡힘이 몸에서 끊어진 채 해방된 공간에 펼쳐지는 중량 없는 인식들의 너울댐, 무無를 느낀 후여야 가능하다. 이때 캔버스는 명확히 한계를 지닌 '무한'의 상상적 대리물이다. 무無의 공간에서 삶은 죽은 채, 죽은 체, 죽어가며 사는 것'들'이다. 죽음이 삶인 채 경험되는, 삶이 역전된 방향에 또 다른 삶의 펼쳐짐을 인식하는 것은 한 몸의 두 목숨과 같다. ● 고요히 한 생명에 두 시간이 겹쳐 흐른다. 두 숨을 오가며 겪는 어둠은 현실을 무엇이든 어떠하든 괜찮다고 어루만지며 한 삶에서 부정되었던 것들을 선명히 떠오르게 한다.

- 이종미_바람_먼지, 안료, 캔버스_162.2×390.9cm_2024_부분
어둠은 머금던 빛을 피운다.

- 이종미_그_먼지, 유화용 오일, 안료, 캔버스_155×120cm_2018~

- 이종미_무無0 먼지, 유화용 오일, 캔버스_50×50cm_2018~

- 이종미_무無0_먼지, 유화용 오일, 캔버스_100×100cm_2024~

- 이종미_파도_펜, 안료, 캔버스_37.5x37.5cm_가변 개수_2024

- 이종미_기도_바늘, 실, 캔버스_15×13×0.5×5cm_2024
앞서 언급했듯 삶과 유비적으로 동등한, 회화는, 캔버스는 존재하지만 인식하지 않았던 다른 겹의 삶을, 죽음을 '먼지'로 받아들인다. 한 존재자로 드러나지 않던 유화용 오일이 무無의 질료로 회화 전면에 작용한다. 운명에 대한 지극한 사랑은 찰라札剌이자 무한한 삶의 켜들을 능청맞게도 허송세월虛送歲月로 토해낸다. ■ 이종미
Vol.20241113c | 이종미展 / BELL LEE / 李鐘美 / painting.instal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