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page
- ● archives
- ● restoration
- ● books
- ● big banners
- ● post board
- ■ neo's search
- ■ about us
- ■ 게재방법 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email protected]
- Tel. 02_335_7922
- Fax. 02_335_7929
- 10:00am~04:30pm
- 월요일~금요일
- 3/3(월) 대체공휴일

관계의 상호작용
Relationship of Interaction
고창선展 / KOHCHANGSUN / 高彰鮮 / video.installation 2024_1026 ▶ 2024_1108 / 월요일 휴관

- 고창선_You are my noise 당신은 나의 노이즈_ 영상설치, 철제 구조, 목조, 빔프로젝터, 컴퓨터, 아두이노 보드, 프로세싱, 초음파 센서_ 130×40×40cm_2024 전시장 공간 이미지 속 개입된 사물의 노이즈 반응영상
●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네오룩 아카이브 Vol.20230406d | 고창선展으로 갑니다.
별도의 초대일시가 없습니다.
후원 / 인천광역시_인천문화재단
관람시간 / 01:00pm~06:00pm 10월 26일_03:00pm~06:00pm / 월요일 휴관
쉬 shhh 인천시 중구 제물량로166번길 5 2층 www.shhh-project.org
본다는 것의 몸짓 찾아가기 ●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출시하며 스마트 폰이 보급된 지도 10여 년이 훌쩍 넘었다. 이 혁신은 우리의 삶의 모습 전반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지 방식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극장에 가야 볼 수 있던 화면이 텔레비전을 거쳐 이제 한 손에 쥘 수 있는 작은 창이 되었다. 휴대가 가능한 스크린의 등장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여전히 커다란 화면이 주는 스펙터클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주 아래 사적인 시선만이 머무는 관람 환경 역시 또 다른, 새로운 경험체계를 선사한다. 이렇듯 뉴미디어 작업은 다양한 외적 환경과 더불어 어떻게 매개하여 보여주는지에 따라 각기 다른 경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매력적인 특징이다. ● 고창선의 개인전 『관계의 상호작용』은 다변화된 매체 환경 속에서 작품과 관람자 사이의 관계 형성을 이끌어내는 시도다. 작가는 화면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보다는 화면 밖의 이야기, 그러니깐 사람들이 무엇을 보는가 보다는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 사실 이러한 작가의 관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것이기도 하다. 2005년 있던 세 번째 개인전에서 그는 처음으로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의 관람자의 태도와 동작에 대해 고민을 꺼내 들었고, 이는 그가 미디어아티스트로 불리게 된 시기와 맞물린다. 그간 선보인 다양한 줄기의 작업이 있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축은 점차 변화되는 기술을 활용하여 '관조'의 의미를 찾아내고, 관람자의 태도를 유발하기 위한 영상, 설치 구조물을 구축하는 것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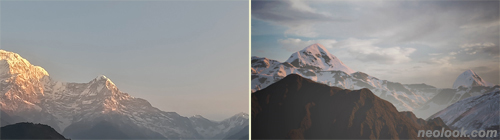
- 고창선_Observer. No1 관찰자 No1_ 영상설치, 목재구조, 빔프로젝터, 아크릴 스크린_ 120×57×127cm, 00:06:13_2024 어디서 보았을 산악풍경 영상 고창선_Observer. No2 관찰자 No2_ 영상설치, 목재구조, 빔프로젝터, 아크릴 스크린_ 120×57×127cm, 00:06:13_2024 어딘가에 있는 풍경 영상

- 고창선_Observer. 감상방법 관찰자_감상방법_2024 어딘가에 있는 어딘가에서 있을 풍경 감상방식
이번 전시에서 관찰자1, 2로 지칭되는 Observer. No1, Observer. No2 작업은 두 개의 목재 구조물로 입체 등변사다리꼴 큰 사각 면에는 스크린이, 대칭되는 작은 면에는 두 개의 구멍이 뚫려있다. 그 외관은 흡사 망원경 같기도, 카메라 옵스큐라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이들의 작동 방식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사이 어딘가에 있다. 암상자 바깥으로 이어지는 지지대에는 빔 프로젝터가 설치되어 아크릴로 만들어진 스크린을 향해 이미지를 투사하며, 우리의 눈에 맞춘 두 개의 구멍을 통해 밀착된 몰입감을 선사한다. 이러한 타인의 시선이나 사물, 주변 환경 등이 틈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물을 통해 작가는 전시장이라는 공적 공간에서의 사적 시선을 만들어낸다. ●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작가가 제시한 캡션에는 기본적인 매체 정보 외에도 흥미로운 단서가 포함되어 있다. Observer. No1, Observer. No2에서는 각각 "어디서 보았을 산악풍경 영상", 그리고 "어딘가에 있는 풍경 영상"이 재생된다. 하나는 그가 지난겨울 다녀온 네팔 히말라야산맥에서 직접 찍은 풍경, 다른 하나는 가상의 풍경의 영상이다, 주관적으로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나 객관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 즉 가상 세계는 현실과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면서도 현실에 닿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낸다. 기술의 발전은 더욱 이들의 거리를 좁혀나가며 사람들의 시지각을 흔들고 있다. 보통의 가상공간을 구성하는 작품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열망, 즉 가상과 현실의 합일을 지향하는 것은 그의 작품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 실상 그의 작업에서 화면 내부 이야기는 중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애초에 우리가 장치를 통해 현실 세계를 담아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시공간을 벗어나 필터를 덧입히는 행위인데, 그것이 직접 찍은 실사인지 혹은 디지털 기술로 구현된 가상의 이미지인지가 중요한 것일까. 그보다 작가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의지를 어떻게 갖는지, 어떤 태도로 보는지에 따라 다른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고창선_The cloud scene No1 구름 No1_빔프로젝트, 삼각 스텐트, 아크릴릭 스크린_가변설치, 00:03:20_2024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구름 영상 고창선_The cloud scene No2 /구름 No2_빔프로젝트, 삼각 스텐트, 아크릴릭 스크린_가변설치, 00:03:20_2024 어디서 본 것 같은 구름 영상

- 고창선_The cloud scene 감상방식_2024 어딘가에 있는 어딘가에서 본 것 같은 구름 감상방식
이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구름과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구름이 담긴 The cloud scene No1, The cloud scene No2 작업을 통해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가상의 공간에서 만들어진 영상은 실재하는 사물과 대상을 본뜬 것들이다. 그것은 어쩌면 어떤 실제 공간에 있을지 모르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풍경들일 수 있다. 이러한 교차는 그의 작업에서 본다는 것, 보는 행위 그 자체에 집중하게 만드는 전략이 된다. Observer 시리즈가 우리의 시야를 한정된 공간으로 제한해 두었다면 The cloud scene에서는 화면의 안과 밖을 관찰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투사되는 화면의 앞면과 뒷면이 열려 있음으로써 관찰자는 자신의 몸짓을 자유롭게 인식하며 작품을 보게 된다.

- 고창선_Kneel down slightly 살짝 무릎을 꿇다_연못_ 영상_00:05:15_2024 앞으로 진실이 될 잔잔한 연못 풍경 영상

- 고창선_Kneel down slightly 살짝 무릎을 꿇다_ 영상설치, 목재구조, 32인치 모니터, 컴퓨터, 아두이노 보드, 초음파센서, 프로세싱 프로그램_ 65×90×85cm, 00:05:15_2024 앞으로 진실이 될 잔잔한 연못 풍경 영상
이렇듯 그가 작업을 통해 만들어내는 몸짓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의 작업에서 시공간성을 포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로 영상매체가 선택되지만 보다 우선되는 것은 어떤 제스처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Kneel down slightly 에서는 이러한 관람자의 행위를 만들어내기 위한 작가의 적극적인 제안이 엿보인다. 나무 기둥으로 세워진 사각 프레임 가운데 모니터를 두고, 그 앞에는 벨벳 천으로 두른 쿠션을 함께 설치한 이 작품은 바닥에서부터 약간 경사진 구조로 세워진 모니터 덕분에 어딘가 서서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느낌을 준다. 작품의 외형이 인도하는 데로 무릎을 살짝 꿇어보면 "앞으로 진실이 될 잔잔한 연못 풍경 영상"이 관람자의 동작에 따라 움직인다. 기도실처럼 보이는 외관을 보고 누군가는 익숙하게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색한 몸짓을 내보일 수도 있다. 보통 우리의 행동양식은 사회, 문화적 관습과 교육 등에 의해 학습된 것에서 기인한다. 빌렘 플루서의 말처럼 우리의 몸짓에서 관찰되는 변화는 우리가 겪는 실존적 변화를 '읽을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이전에 관찰되지 않았던 몸짓이 나타날 경우 그것이 새로운 형태의 삶을 읽어낼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이번 전시의 메인 작품이기도 한 You are my noise는 전시가 진행되는 지금 여기의 풍경을 담고 있다. 360도로 담아낸 전시장 화면 속 관람자의 움직임은 미세하게 지글거리는 노이즈로 시각화된다. 화면은 우리의 형상 자체를 재현하지 않는다. 다만 작품을 바라보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시각적 파동을 만든다. 관람자가 작품을 보는 몸짓이 더해질수록 그 흔적이 화면에 고스란히 반영되며 작품에 대한 개입으로 연결된다. 그의 작업 개념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성은 중요한데, 특히 하이테크와 로우테크를 넘나들며 작동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교차는 작가에겐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그는 흑백 화면에서부터 컬러로 전환되는 충격에서부터 가상공간의 영역까지의 다변화된 매체 환경을 경험한 세대이기도 하다. 그래서 더욱 그가 발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낯설어할 수 있는 관람자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이들의 감상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게 된 것일지 모른다.

- 고창선_Dynamic visual acuity 동체 시력_00:04:55_2024 고창선_Walk in the forest_virtual walk 숲속의 산책_가상의 산책_00:04:35_2024 고창선_Stopped gaze 멈춰진 시선_00:03:57_2024

- 고창선_I'll show it only to you 너에게만 보여줄게_ 55×85×55cm, 가변설치_2024 목재로 제작된 사각뿔 구조물을 통해 영상을 볼 수 있음
우리가 '보는 의지'를 어떻게 갖는지에 따라 경험의 층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작업을 읽는 데 중요한 지점이다. 전시장 한쪽에 위치한 모니터에서는 3개의 영상이 이어 재생되는데 이 역시 관람자의 몰입을 위해 시선을 모아두는 방식으로 목재 구조물이 설치되어있다. 이번 전시의 다른 작업들이 구체적으로 보는 이에게 몸짓을 제안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작가 본인이 보는 방식과 태도를 공유하고 있다. 그는 Dynamic visual acuity를 통해 자전거를 타고 오가며 보았던 풍경을 일인칭의 시점으로 담기도 하고, Walk in the forest virtual walk에서처럼 가상의 숲속을 탐험하는 시선을 공유하거나 Stopped Gaze를 통해 여행지 어딘가에서 멈추어 담은 풍경을 보여준다. 작가는 유독 야외 자전거를 타는 것은 즐기는데, 특히 자전거가 향하는 방향과 반대로 스치는 화면 속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의 작업을 통해 속도감 있는 풍경 속 작가의 시선을 함께 따라가 보기도, 멈추어 보기도 하며 찬찬히 움직이는 대상을 관조해 볼 수도 있다. ● 고창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여러 방식으로 공적인 공간 속 사적인 시선을 만들고, 그 가운데 '보기'를 위한 태도를 형성하는 장치들을 마련해 두었다. 전시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가 설정해 놓은 무언의 매뉴얼을 따라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자. 우리의 눈이 대상을 향해 있더라도 그것을 인지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우리의 감각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동시키는지에 따라 볼 수 있는 대상과 그 범주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관계의 상호작용이란 인터렉티브 아트 작품이 주로 갖는 작동 방식의 단순한 유희를 지나 주체와의 관계 맺기를 지속적으로 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시장을 나올 때쯤이면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 너머에 있는 우리의 몸짓을 다시금 떠올려볼 수 있지 않을까. ■ 최지혜
Vol.20241026e | 고창선展 / KOHCHANGSUN / 高彰鮮 / video.instal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