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page
- ● archives
- ● restoration
- ● books
- ● big banners
- ● post board
- ■ neo's search
- ■ about us
- ■ 게재방법 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email protected]
- Tel. 02_335_7922
- Fax. 02_335_7929
- 10:00am~04:30pm
- 월요일~금요일
- 3/3(월) 대체공휴일

숨겨진 빛 LUMIERE CACHEE
한홍수展 / HANHONGSU / 韓洪守 / painting 2017_0123 ▶ 2017_0228 / 일요일 휴관

- 한홍수_육체의 대각선_캔버스에 유채_100×100cm_2016
초대일시 / 2017_0126_목요일_06:00pm
관람시간 / 11:00am~07:00pm / 일요일 휴관
Galerie BOA 11 rue d'Artois, 75008 Paris, France Tel. +(0)33.1.45.63.77.41 www.galerieboa.com
한홍수 - 천사들이 지나가는 화폭* ● 근래 한홍수의 그림 속에는 모든 것이 평평하고 모든 것이 떠다닌다. 어떤 것도 고정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중력 상태의 존재가, 원활한 흐름에 대한 비유들이, 그 것 들로 다루어진 모든 주제들이, 꿈꾸는 상태를 연상하게 한다. 극도로 매끈한 바탕 위에 입혀진 반짝이는 글라시의 투명한 겹, 부드러운 붓으로 여러번 쓸어내고 닦아낸 소재,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늘색과 인적 드문 산 속의 호수면과 같은 색들에 어린 두터운 빛...... . 작품에 사용된 모든 것들이 뉴질랜드 가수 그래임 올라이트(Graeme Allwright)의 천진한 노래 가사처럼 「너의 눈을 가리고 별들의 소리를 들어봐, 모든 것이 조용하고, 모든 것이 쉬고 있어......」라고 속삭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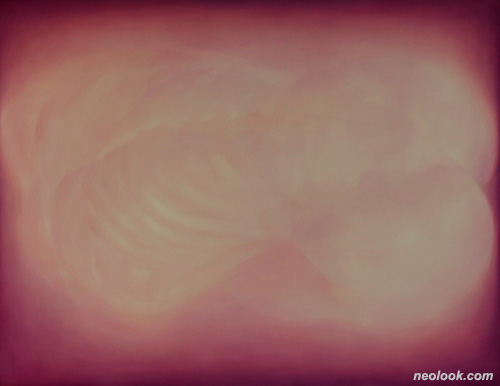
- 한홍수_부유하는 기표_캔버스에 유채_89×116cm_2016

- 한홍수_욕망하는 기개_캔버스에 유채_100×81cm_2016

- 한홍수_totem_캔버스에 유채_100×73cm_2016

- 한홍수_totem_캔버스에 유채_100×73cm_2016
안개에 가려 모호한 공간에 떠다니는 육체의 대각선, 구부리고 경사진 등, 또는 정지한 듯 쉬고 있는 어깨의 곡선, 직시하는 시선의 광채...... . 이런 요소들은 19세기의 상징주의자들을, 아니 더 나아가 벨기에 작가 릭 뛰망(Luc Tuymans)이나 독일작가 게라르 리히터(Gerhard Richter)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20세기 말의 구상회화를 떠올리게 한다. 이 작가들이나 한홍수가 인간을 그려낼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화폭을 매끄럽게 하고, 후광으로 장식하고 또 흐리게 하여 화폭을 차분하게 가라앉힌다. 어떤 부연도 세부사항도, 어떤 세부묘사도 없고, 거의 정보도 없다. 그러나 수많은 미광으로 가득 채워서 은은한 빛을 발하게 한다. 이것은 그가 서양의 르네상스가 지시하는 행동파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조건을 찬양하는 것을 거부하고, 단지 신낭만주의 방식으로 그지없이 덧없고, 한없이 연약하며, 가상적이기 까지 한 인간 존재를 설명하는 방식인 것이다. ● 네덜란드의 화가 램브란트의 화법에서도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는 한홍수의 내부로부터 우러나오는 빛에 비추인 -한홍수는 「빛의 살아있는 모습」을 좋아 한다- 얼굴들은 오늘날 TV와 컴퓨터 화면이 형태를 이루는 방식의 조광법에 의해 그려진다. 한홍수는 카토딕(cathodiques. 부라운관 영상화 한)한 천사들을 그린다.

- 한홍수_계곡들_캔버스에 유채_60×73cm_2016

- 한홍수_계곡들_캔버스에 유채_60×73cm_2016

- 한홍수_계곡들_캔버스에 유채_54×65cm_2016

- 한홍수_계곡들_캔버스에 유채_46×55cm_2016
1999년에 그는 「건조함은 균열의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균열은 부화의 필수 조건이 된다.」라고 기록한다. 이 시기에 그는 전쟁 이후의 인간들을 그렸는데, 거듭 태어남을 암시하기 위해 두껍게 칠한 니스의 실금과 균열을 주된 표현 기법으로 삼았다. 지각(地殼)덩어리로 표현되고 유성(流星)의 표면을 연상 시키던 이 유령 대신에, 이제 한홍수는 고독하고, 불확정적이며, 비육체적인 존재를 선호한다. 이들을 맑게, 투명하게, 차분하게 가라앉혀 표현하기를 원한다. 또한 이들을 고요하고 만질 수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말한다. ● 요즘 한홍수는 개와 늑대 사이*에서, 즉 황혼이 지는 무렵에 작업한다고 한다. 이 시간대는 동양에서는 영감을 구하는 사람들이 작업하는 시간이라고 들었다. 예술은 종교나 과학과 마찬가지로 신비한 것에서 그 영감을 찾는다. ● 오래전에 한국에서 배웠던 것들도, 뒤셀도르프 아카데미에서 1990년대 초반에 배웠던 펭크(Penck)도 이제 모두가 그저 지나간 일들에 불과하다. 7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빠리 근교에 있는 불로뉴 작업실에서, 그는 이제 늘 라디오를 켜고, 고전음악의 선율 속에서 작업한다. 그리고 오늘날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 즉 인간들이 자신에 대해 고찰할 시간을 얻는 방식과 흡사한 나전기법을 통한 표현에 전념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우리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단지 지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 프랑스와즈 모낭
* 주석 - 천사가 지나간다 (les anges passent)* 대화중에 잠시 침묵과 고요함이 찾아 올 때, 프랑스 사람들은 그 때를 「천사가 지나간다」라고 표현한다. - 개와 늑대사이* 하늘이 완전히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황혼 무렵

- 한홍수_빛의 풍경_캔버스에 유채_38×55cm_2016
Hong-Su Han - Des anges passent ● Tout plane, tout flotte, dans les toiles d'Hong-Su Han, depuis deux ans. Rien ne nécessite une ancre. Allégories du passage fluide, de la présence en apesanteur, chaque sujet abordé évoque une apparition onirique. Supports vertigineusement lisses, glacis miroitants, matière essuyée au chiffon doux, tons célestes ou aquatiques, lumières de profondeurs… Ce qui est mis en œuvre murmure, comme dans la comptine du chanteur néo-zélandais Graeme Allwright, 「tes yeux se voilent. Écoute les étoiles. Tout est calme, reposé…」 ● Dans un espace vaporeux, la diagonale d'un corps qui flotte, la courbe d'un dos penché ou d'une épaule au repos, l'étincelle d'un regard droit… On songe aux symbolistes du XIXe siècle et plus encore à la manière dont a ressurgi la figuration à la fin du XXe siècle, dans les peintures de l'Allemand Gerhard Richter ou du Belge Luc Tuymans par exemple. Pour eux comme pour Hong-Su Han, évoquer l'être humain c'est d'abord le lisser, le nimber, le flouter. L'apaiser. Nulle anecdote, aucun détail, peu d'informations mais beaucoup de lueurs… Il ne s'agit plus de célébrer la condition humaine, à la manière militante héritée de la Renaissance occidentale, mais de rendre compte, de façon néo romantique, du caractère merveilleusement éphémère et fragile, voire, virtuel, de nos existences. ● Éclairées de l'intérieur, certes dans la tradition du maître flamand Rembrandt – Hong-Su Han aime 「l'aspect vivant de sa lumière」 - les figures le sont plus encore à la manière dont aujourd'hui les écrans, de télévision ou d'ordinateur, nous renvoient les formes. Hong-Su Han peint des anges cathodiques. ● 「La sécheresse est une condition sine qua non de la fissure. Mais la fissure est aussi une condition sine qua non de l'éclosion」, écrivait-il en 1999. À cette époque, les êtres d'après-guerre qu'il peignait 「surgissaient de craquelures, de fissures, pour suggérer une renaissance.」 À ces revenants - dont la carnation évoquait des météores - émergeant en grappes d'une croûte vaguement terrestre, Hong-Su Han préfère à présent des présences solitaires et indéfinies, moins charnelles. 「L'objectif est de les rendre claires, limpides, sereines」 dit-il ; silencieuses et intouchables, aussi. ● Hong-Su Han dit encore qu'il peint désormais 「entre chien et loup」, dans ces moments où 「en Asie, les personnes qui cherchent les bonnes ondes opèrent toujours… L'art, comme la religion et la science, prend toujours sa source dans le mystère.」 ● Les leçons apprises en Corée sont loin ; loin aussi, les cours du peintre Penck, suivis au début des années 1990 à l'Académie de Düsseldorf. Dans l'atelier où il s'est installé il y a sept ans, à Boulogne, en banlieue parisienne, au son permanent de la musique classique européenne que diffusent la radio, Hong-Su Han est désormais attelé à une représentation nacrée de la manière dont les êtres d'aujourd'hui se vivent, lorsqu'ils prennent le temps de se contempler. Nous ne comprenons rien à ce qui nous entoure, mais c'est logique : nous ne faisons que passer. ■ Françoise Monnin
Vol.20170123b | 한홍수展 / HANHONGSU / 韓洪守 / pain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