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page
- ● archives
- ● restoration
- ● books
- ● big banners
- ● post board
- ■ neo's search
- ■ about us
- ■ 게재방법 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email protected]
- Tel. 02_335_7922
- Fax. 02_335_7929
- 10:00am~04:30pm
- 월요일~금요일
- 3/3(월) 대체공휴일

2017 Cre8tive Report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展 2017_0106 ▶ 2017_0218 / 일,월요일 휴관
초대일시 / 2016_0106_금요일_05:00pm
참여작가 김치신_박상희_박형진_송윤주_실버스타 정아롱_조현익_최수진_우촨룬 吳權倫
관람시간 / 10:00am~06:00pm / 수요일_10:00am~09:00pm / 일,월요일 휴관
OCI 미술관 OCI Museum Of Art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14(수송동 46-15번지) Tel. +82.(0)2.734.0440 www.ocimuseum.org
기운은 되로 주고 영감은 말로 받다 ● 혹자는 세상에서 가장 신념이 뚜렷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이 센 인간 부류로 작가를 꼽곤 한다. 반은 맞지 않나 싶다. 작품 세계의 지반은 굳기가 금강석이요, 껍데기를 비집는 안력은 그 끝이 바늘 같고, 생각의 전압은 짜릿하리만치 높아야 작가라 부를 만하니. 그러나 속이 굳셀수록 겉은 말랑해야 하는 게 또 작가다. 가시 돋은 진리를 끌어안을 너른 품이 있어야 하고, 세상사 자초지종 맥을 훑을 섬세한 손도 필요하고, 아픈 곳을 찾을 줄 아는 뜨거운 공감 회로도 장착해야 한다. 그래서 반만 맞다. ● 작가는 사람이고 작업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다. 강가에서 모래 몇 삽 푸려 해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데, 하물며 작업 세계를 꾸려나감에 주변의 영향이 없을 수가 없다. 도심 빌딩 숲 한가운데 자리한 작은 작업실에 입주하게 된 어느 작가가 하던 말이 떠오른다.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해보겠어요. 창밖 빌딩 숲이 당분간 제 작업의 아이디어 숲이 되겠는데요!" ● 그런 면에서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는 제법 특별하다. 그 흔한 편의점 하나 없이 외진 곳에 옹기종기 서로 부둥켜안고 여덟 칸이 꼭꼭 뭉쳐 있다. 쓸데없이 꾸준한 쌩쌩 화물차 소리, 휑한 바람소리가 앞다투어 반긴다. 서로의 문소리 발소리가 돌비 서라운드로 울려대는 적응기를 지나면, 현관 번호키 찍는 리듬과 각자의 발걸음이 지닌 아우라가 느껴지기 시작하며 원본성이 실재함을 참마음으로 긍정하게 된다. 서로의 습관에 익숙해지고, 가끔 들르는 지인들과 인사하고, 기웃기웃 하나 둘 작업을 알아 간다. 기운과 영감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자기장(磁氣場), 아니 '창작장(創作場, inspiring field)'을 공유하기에 이른다. 작업실이라고 기계의 모터처럼 마냥 뛰기만 하는 곳이 아니다. 작업은 캔버스에 무언가를 휘갈기는 것보다, 그를 위해 취재하고 사유하고 자재를 구해 나르는 것보다, 더 넓고 큰 의미이다. ● 영향이란 긍정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뒤섞여 있기 마련이지만 취사선택(取捨選擇) 하여 자기의 것으로 녹여낼 역량을 갖춘 작가들이다. 그들은 본의 아니게 서로를 창작하기도 하는 셈이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작업 보고이면서, 동시에 작가로서의 한 해를 공유하는 마무리 의식이며, 또한 창작스튜디오가 제출하는 단일한 결과물로 봐도 좋을 것이다. 각각 개인, 집단, 기관 차원의 의의라 하겠다.

- 김치신_Bending_7개의 야구방망이에 락카스프레이, 방망이 거치대_가변설치_2016
시간은 지칠 기색 없이 줄곧 흐른다. '현재'는 바로 다음 순간에게 그 지위를 넘기고 과거로 전락한다. 끝없이 갱신되는 '지금'이란 그토록 특별하다. 무서운 휘발성을 생각하면, 사진이나 기록이란 유리병에 담으려는 시도는 어쩌면 자연스럽다. 김치신은 세상과의 시간적 접점인 '지금'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포착한다. 국내외 사회적 이슈에서 개인의 단상까지 범위도 드넓다. 대단한 토픽일 필요는 없다. 뜯어고치려 드는 것도 아니다. "악플보다 무플이 무섭다" 했다. 그의 작업은 현재에 대한 반응이자 댓글이며 현실 팬아트이다. 패러디일수도 때론 오마주일수도 있다. 관상식물을 눈으로 음미하듯, 요모조모 현실을 곱씹는다. 현재의 되새김인 동시에, 이 행위 자체도 다시 '소중한 현재'에 편입한다. 마냥 심각하기만 한 건 아니다. 주먹 실루엣의 현판에 버젓이 새긴 "(안)때리는 어린이집", 물총 상자1)에 그려 넣은 시위 진압 경찰... 심각한 이면에 유머를 발라 매운 맛은 중화하고 은근한 반전의 맛을 더한다. 한약을 삼킨 아이에게 사탕을 쥐어 주듯, 두고두고 붙들어 더 깊은 생각을 유도한다.

- 박상희_홍콩 소호 밤_캔버스에 아크릴채색, 비닐 시트 커팅_112×145.5cm_2016
밤은 어둠과 숙연, 침잠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을 기웃대기 마련이다. 빛은 더 큰 빛 앞에 얌전하지만, 어둠 앞엔 본색을 드러내는 법. 그래서 낮은 우직하게 밝고 밤은 다소곳해도 현란하다. 박상희는 도시의 밤을 캔버스에 아로새긴다. 에두른 표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캔버스에 시트지와 물감으로 층을 올리고 칼로 파낸다. 모든 빛을 훌렁 다 드러내어 현란하기보다, 파낸 단면을 비집고 언뜻언뜻 색을, 빛을 엿보여 어둠 속을 들추고픈 호기심을 자극한다. 비스듬히 파여 드러난 단층은 마치 여러 장의 그림이 촘촘히 포개어진 양, 물리적 제약을 단숨에 극복하고 캔버스를 무한정 넓고 깊게 확장해 나간다. 여러 시간과, 시각과, 생각의 판들이 하나로 압착된 듯 강렬한 시각적 암시를 던진다. 반대로 이는 질료성을 그리 철저히 숨기지 않고 순순히 드러내어, 환영을 보고 그 속에 깊이 빠져들며 표면에서 멀어지는 것을 막는다. 물감과 시트 덩어리임을 자백하여 오히려 '실재를 그림'이라는 명백한 사유서를 제출하고 있다.

- 박형진_푸른 물_장지에 혼합재료_130×162cm_2016
자본은 자연을 재단한다. 공사장마다 네모로 몇 길을 파헤친 구덩이에 빼곡히 철제 빔이 틀어박히고, 남은 공간엔 철근과 콘크리트가 들어찬다. 고속도로나 철길을 달리다 보면 깔다 만 도로와 스테이크처럼 뚝뚝 잘려나간 산등성이를 어렵잖게 볼 수 있다. 박형진은 '단절된 풍경', 혹은 '풍경 속 단절'을 면밀히 응시하고 인내로 건져 낸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정원이란 백에 아흔아홉은 기하학적으로 재단하여 조성한 자연, '인공 자연'이다. 경계 없이 연속되던 산과 들은 납골묘와 공원, 도로로 재단되어 불연속의 연속으로 바뀌어 간다. 수면 위에서 바닥까지 공기와 물과 고기가 한 덩어리였던 냇가는 녹조로 층층이 숨이 단절되고, 면면부절 흐르던 강은 수중보로 마디마디 썰린다. 자주 보이는 모눈은 연속을 끊어 내는 불연속, 아날로그를 훑는 디지털의 시선을, 균일하고 덤덤하게 담아내는 그물로 안성맞춤이다. '천망회회소이불실(天網恢恢疎而不失)'2)이라고, 하늘의 그물과 같은 이 모눈은, 핏대 세우며 부르짖지 않아도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엄숙히 추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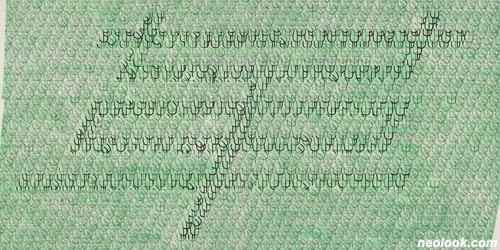
- 송윤주_革草 Revolutionary People_한지에 잉크, 안료, 스크래치_100×200cm_2016
화폭(畵幅), 그림이란 어쩔 수 없이 폭이 있기 마련이다. 무던히 넓고 깊은 우주를, 셀 수 없이 다양한 천지 만물을 유한한 화폭에 담으려는 시도는 어쩌면 덧없는 것, 불합리한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송윤주는 합리 바깥을 인정함으로써 드러난 현상을 넘어 무의식과 우연의 요소까지도 아군으로 포섭3)한다. 음양이 순환하며 삼라만상을 꾸려 나가는 양태를 주역4)의 64괘5)로 수렴한다. 이 괘체(卦體)는 부호화된 음양의 조합이다. 괘의 내용을 괘사(卦辭)라 하는데, 우선 특성을 괘명(卦名)으로 압축해 문자로 표현한다. 저마다의 괘상(卦象)을 지녀 삼라만상의 이미지를 담고, 괘덕(卦德)으로 전이해 무형의 가치와 개념까지도 포용한다. 이를테면 양음양은 불이고, 그게 둘이면 불이 겹쳐 중화이(重火離, ䷝)가 되고, 불과 불이 만나니 태양과 같은 상이며, 이는 격렬히 융성함을 의미한다. 마치 데리다6)의 그림-문자의 분화를 거꾸로 돌리는 듯한 동화작용으로 언어적 단절성을 극복한다. 미신이 아니다. 천지의 도를 투영해내는 것은 변화를 이해하고 예측하며 대처에 대한 당위성을 획득하는 삶의 철학이며 지혜이다.

- 실버스타_아홉개의 달이 뜨는 밤_캔버스에 유채_24×24cm×9_2016
배우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이런저런 캐릭터로 변신을 거듭하는 특이한 직업이다. 그런데 그 배우가 사람이 아니라 캐릭터면 어떨까? 실버스타는 이런 '배우 캐릭터'들을 거느린, 현실 너머 또 다른 세상의 스타군단 'SSK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한다. 작가는 가상 세계에서 기획사를 운영하며 비로소 'PD 실버스타'가 된다. 그는 현실과 가상 세계를 오가며 차원 간 소통을 담당한다. 소속 배우 캐릭터들은 가상 세계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한다. 작품 하나하나는 그들 입장에서, 배역을 수행할 가공의 무대들이다. 캐릭터가 캐릭터를 연기하는 셈. 그러므로 이들은 가상과 '가상 속 가상'을 오가며 활동한다. 마치 실버스타가 현실과 가상을 누비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실버스타의 작업은 관객과 손잡고 차원을 뛰어넘어 다니는 고무줄놀이와 같다. 재미있는 것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뒤 그 꿈을 회상하는 것처럼, '작가' 실버스타는 이 모든 놀이를 페인팅, 설치, 퍼포먼스 등 현실에 선보일 작업의 소재로 삼는다는 것이다.

- 정아롱_숲길 속 산책_에폭시 몰딩 컴파운드에 에그 템페라_14×15cm_2016
'클래식'의 이미지를 한 단어로 축약하면 향수(鄕愁)가 떠오른다. 옛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어찌 그저 지역적인 것에 그칠까. 그 중심엔 순수함에 반짝이던 눈망울, 작은 것에도 신기해 두근거리던 시절의 그리움이 있다. 정아롱은 숲 속에 잠든 회화의 소싯적 낭만을, 유니콘을 타고 느긋하게 찾아 들어간다. 숲은 겹겹이 우거져 미지를 향한 기대감을 품고 있다. 유니콘은 현실을 뛰어넘어 멀리 상상 속을 거니는 동물이다. 가려지고 멀어져야 신비감이 생긴다. 신비감은 아무나 흉내 낼 수 없음으로 원본성과 정통성을 과시하며 아우라7)를 형성한다. 물론 지금을 사는 그의 작업이 지난 시절 회화의 아우라를 그대로 복원, 계승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확연한 로망을 품은, 게다가 그 방향마저 이제 오히려 생경한 현대적 주술을 또 어디서 찾을까? 아스팔트로 점철된 한 귀퉁이에 꿋꿋하게 뻗은 비포장길은 참신하게 다가온다. 21세기의 그것은 '고리타분' 대신, 소원해진 원초성에 대한 '순수한 관심'에 가깝다.

- 조현익_믿음의 도리-탄생 Ⅱ_황동판에 혼합재료, 스크래치, 나무패널_300×180cm_2016
2016년도 유행어에 "뭣이 중헌디?"8)를 빼놓을 수 없다. 조현익의 작업이야말로 뭣이 중헌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물리적이든 시간적이든 사고 차원에서든 가치의 밀도가 균일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돌 고르던 흙바닥에 떡하니 박힌 금덩이를 돌자루에 한데 우겨다 버리는 건 사실 최영 장군도 쉽지 않을 일이다. 때론 '흙수저', '금수저'와 같은 말로 처지를 나누기도 한다. 소중함, 변치 않을 꾸준함을 대표하는 것이 금(金)이라면, 내 금과 네 금은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진짜 금이고 무엇은 그저 도금에 불과한지 진맥한다. '네 금'과 관련해, 종교적 믿음, 사회적 이념이 일그러지는 실태9)를 '금속'판에 짜낸다. 한편으론 어린 아들이 옹알이를 깨고 서툴게 흘린 한 마디를 금테 두른 상장에 조심스레 담고 액자까지 씌워 고이 모신다. 짤막한 대사 한 토막이 아빠에겐 톨스토이 전집보다 더 큰 기쁨과 감동을 주다니! 가히 '내 금'이라 할 만 하다. 금이며 복음이 저 구름 위에 있는 게 아니다. 밥그릇과 숟가락이 부딪는 소음이야말로 삶의 복음(福音)임을 내보인다.

- 최수진_수평선을 짜는 사람_캔버스에 유채_90.9×90.9cm_2016
작업도 삶의 일부이다. 멋진 소재를 찾아 삶을 더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최수진 역시 빛나는 삶의 기억과 감정 조각을 더듬어 왔다. 이윽고 화가로 사는 스스로를 새삼 돌아보며 자기 참조를 거듭하기에 이르렀다. 화가에게 그림 그리는 일보다 근사한 순간이, 또 그럴듯한 소재가 어디 있을까? 창작의 모든 여정이 그림이 된다. 색을 캐고, 캐낸 색 더미에서 싱싱한 '색덩이'를 고르고, 설익은 녀석은 고이 숙성시킨다. 수평선을 짜고, 숨을 푸고, 바람과 구름을 배달한다. 생각과 의지는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해 이 많은 역사(役事)를 감당하느라 여념이 없다. 마치 꽃물을 내어, '물 내기 전의 꽃'을 그리듯, '잘 익은 색'으로, 그림 속 '설익은 색덩이'를 채우며 스스로를 다시 참조한다. 그 활달하고 기발하며 거룩한 과정 하나하나가 바로 지금 선보이는 그림이다. 말하자면 '그림 그리기'를 그린, '메타 그림'이다. TV속 배우들이 TV를 시청하는 장면이 떠오른다. 어쩌면 곧 '메타 그림 그리는 그림'이 나올지도 모른다.

- 우촨룬_Stone Pile-1_인화지, 나무_200×101×106cm_2016
'부분의 합과 전체는 같지 않다'는 말이 있다. 나무를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한 것과 숲은 다르다. 나무는 그저 홀로 비바람에 부대낄 뿐이지만 숲은 갖은 새와 동물들을 부른다.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도 마찬가지이다. 그저 작업실 여덟 칸을 잇닿아 옹기종기 기워 놓은 게 아니라, '창작스튜디오'라는 숲 하나가 돈독히 우거지길, 같은 것 하나 없이 개성 넘치는 별별 새와 동물들을 품을 수 있는 울창한 숲이 되길 희망한다. ■ 김영기
* 각주 1) 제품명부터 무려 「112경찰POWER물총」이다. 어디서 이런 디테일의 물건을 구했는지... "경찰모자 쓰고 파워물총으로 절대강자가 되라!"는 문구도 심각하면서 익살스런 맛을 더한다. "되어라!"가 올바른 표현이겠으나 여기선 원본 표기를 존중한다. 2) 하늘의 그물은 성글지만 놓치는 법이 없다, 노자(老子) 도덕경-하편(德經) 제 73장 임위편(任爲篇) 3) 우연 역시 세상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바, 세상을 구성하는 이치(理致)는 그조차 포괄한다. 어쩌면 우연이라 부르는 행위조차 필연의 부스러기일 수 있다. 이것이 큰 의미의 합리(合理:이치에 부합함)이다. 4) 『역경(易經)』으로도 불린다. '易'의 주요한 의미는 '서로 교환하다, 입장 혹은 현상이 바뀌다, 그리하여 새로워지다'로 요약할 수 있다. 5) 천지만물의 변화 원리를 '효(爻)'라는 일종의 부호의 조합으로 압축한 것이다. 효 하나가 陰 혹은 陽을 나타낸다면 3효는 8(=2³)가지의 단괘(單卦)를 형성하고, 둘을 조합해 64(=2⁶)중괘(重卦)를 이룬다. 6)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에 의하면 초기의 그림문자는 말 그대로 '그림문자'로 작용했으나, 이들의 분화로 그림과 글 각자의 역할은 보다 뚜렷해졌다. 글과 그림은 저변에 공통분모를 둔단 이야기인데, 따라서 두 언어가 완전히 유리된 것이 아니다. 7) 실제로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은 이 용어의 의미상 모호성과 불분명한 적용 경계로 인해 신비주의적 요소로 비판받은 바 있으며, 특정한 가치판단 없이, 단지 복제기술의 본격 도래로 예술 작품이 받은, 가장 주목할 만한 영향으로 보았다. 다행히도, 신비함과 복고의 로망에 누가 되지 않을 어감을 지녔다는 말이다. 8) 영화 『곡성』(2016)에 등장한 대사. 영화를 보지 않았음에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던 유행어였다. 9) '實態'. 그런데 '失態'라 보아도 통하는 그 어감이 제법 괜찮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살며 여태 보고 줄곧 겪어 왔듯, 신념의 기치가 드높을수록, 또 널리 세상을 덮으려 할수록, 본디의 면목은 희석되고 기득에 대한 집착과 폭압의 농도만 쓸데없이 걸쭉해진다.
Vol.20170106a | 2017 Cre8tive Report-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