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page
- ● archives
- ● restoration
- ● books
- ● big banners
- ● post board
- ■ neo's search
- ■ about us
- ■ 게재방법 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email protected]
- Tel. 02_335_7922
- Fax. 02_335_7929
- 10:00am~04:30pm
- 월요일~금요일
- 3/3(월) 대체공휴일

그어 가두다
이대영_차주용 2인展 2015_1105 ▶ 2015_1117 / 백화점 휴점일 휴관

- 이대영_경계#11_피그먼트 프린트_90×130cm_2015
초대일시 / 2015_1105_목요일_06:00pm
관람시간 / 10:30am~08:00pm / 주말_10:30am~08:30pm / 백화점 휴점일 휴관
롯데갤러리 청량리점 LOTTE GALLERY CHEONGNYANGNI STORE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전농동 591-53번지)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8층 Tel. +82.2.3707.2890 blog.naver.com/lotte2890
경계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 일찍이 철학자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 - 1650)는 자유를 통해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자유는 한계를 모르기에 그 자체만으로도 무한성을 갖기 때문이다. 유한한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란 존재할 수 없으며, 다만 자유를 향한 의지만이 기억되고 재생되어 바뀐 환경과 시련 속에서 끝없이 새로워진다. 세계를 확인하는 우리의 감각도 신과 자연이라는 알레고리(allegory)로 등장하는 자유의 무한성과 대치되는 일정량의 한계와 크기를 설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계를 우리의 습관적 인식 능력 안에서만 이해하려는 관성(慣性)이 의심 없이 작용할 때 인간의 유한성은 더욱 위축되고, 더불어 세계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이해는 방해받게 된다. 자유의 영역이 작게 그려지면 질수록 인간은 무한한 세계로부터의 소외를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되고, 삶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 능력은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된다. 굳이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라는 비트겐슈타인(Ludwig Josef Johann Wittgenstein, 1889 - 1951)의 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인식의 확장 없이 인간의 자유는 결코 이미 그어진 선을 넘어 설 수 없다. 즉, 인간의 역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신과 같은 무한성을 흉내 낼 필요는 없겠지만, 이러한 세계에 대한 인식의 확장은 우리에게, 특히 예술가에게는 본질적인 명제이다. 유한한 존재이기에 타고난 소외를 극복할 순 없겠지만, 우리는 늘 주어진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려 했고, 그 파란만장한 시도들로 인해 인류는 진보와 혁신의 달콤한 열매도 맛보았다.

- 이대영_경계#03_피그먼트 프린트_90×130cm_2015

- 이대영_경계#33_피그먼트 프린트_90×130cm_2015

- 이대영_경계#100_피그먼트 프린트_75×100cm_2015

- 이대영_경계#45_피그먼트 프린트_90×130cm_2015
이대영과 차주용의 사진전 『그어 가두다』도 바로 이 시도의 연장선에 있다. 달콤한 열매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진이라는 '또 하나의 감각체'를 통해 한정적인 세계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확장된 사유를 제안한다. 두 작가는 우리의 시각적 체험이 인식의 영역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탐구하면서, 세계를 감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래서 이들은 우선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공간을 응시하고, 느끼고, 카메라에 담는다. 자연 상의 변화와 운동을 구분 짓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는 사고방식은 두 작가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다. 낮이 밤으로 되고, 바다가 하늘과 서로 바라보고, 위가 아래와 교차하며, 벽이 다른 벽과 만나는 지점은 이들에게 모두 점진적인 흐름이며 연결이다. 마치 자연의 속성이 '풀이 흙(土)에서 자라나는 형상'을 본뜬 생(生)으로 귀결하듯이 말이다. 흙이 풀과 뿌리로써 세상과 연결되고, 비와 바람과 태양은 이들과 두루 관계하며 자연의 연속을 지지하듯이 두 작가의 세계는 언제나 진행형인 열린 공간이다.

- 이대영_경계#39_피그먼트 프린트_90×130cm_2015

- 이대영_경계#48_피그먼트 프린트_75×100cm_2015

- 이대영_경계#05_피그먼트 프린트_75×100cm_2015
작가 이대영은 그래서 특별히 자연의 이어짐에 주목한다. 작가는 우선 하늘과 바다처럼 전혀 섞일 수 없어 보이는 두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그의 작품에서 하나의 화면을 정확히 분할하고 있는 선(線)은 세계를 한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원인인 우리의 이분법적 발상을 의미한다. 그 이분법으로 갈린 자연은 작가에게 이어짐을 외면한 채 단절로 존재는 세계이다. 그 세계는 명확하되 고정되어 있고, 독해는 쉬우나 정답에서는 벗어나 있다. 그래서 이대영에게 자연은 사진의 첫인상처럼 구분과 이질성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요소가 섞이고 반응하며 공존하는 공간이다. 카메라 렌즈와 그 렌즈를 꿰뚫는 예리한 시선은 자연의 경계를 명확히 재현하는 듯하지만, 그의 속내는 오히려 그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자연의 원초적인 생태를 담으려 한다. 그런 이유로, 작가의 자연에서는 파도의 너울거림과 대기의 흐름이 시시각각 그 모습과 색을 달리한다. 그때그때의 감정은 수평선의 선명함과 흐림을 통해서 각기 다르게 감상자들에게 전달된다. 한 작품에서 첫눈에 느낀 두 세계의 극명한 대조는 또 다른 작품에서 하나의 통일된 색조로 감각되는데, 이때 감상자들은 분명했던 경계선에 대한 굳은 믿음을 의심하게 된다. 작품을 따라가다 보면 인상파 화가 모네의 수련 시리즈를 떠올리게 하는 관념의 오묘한 뉘앙스가 느껴지고, 하늘과 바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 어느새 경계를 넘어 하나의 통일된 추상으로 향한다. 이렇듯 분할로서의 화면과 통일로서의 화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대영 작업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꼭 쥐고 있으면서도 극적인 반어법을 사용하여 우리의 관심을 잡아끈다. 그것을 통해서 작가는 자연이 끝없이 연속함으로써 살려 놓은 세계의 감정을 굳이 나누려는 인간의 태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우리에게 묻는다.

- 차주용_모서리#66_피그먼트 프린트_160×120cm_2015

- 차주용_모서리#55_피그먼트 프린트_160×120cm_2015

- 차주용_모서리#44_피그먼트 프린트_160×120cm_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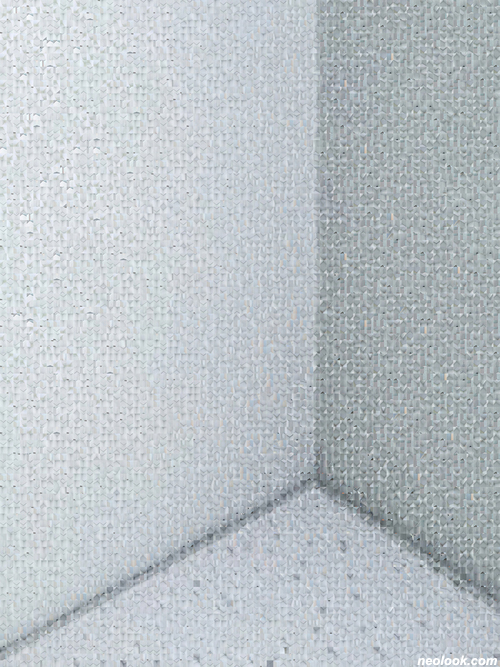
- 차주용_모서리#45_피그먼트 프린트_100×75cm_2015
이러한 질문은 차주용에게도 특별하다. 작가는 인간의 고정된 한계가 결국 움푹 들어간 모서리를 만들고 인간을 그 안에 안주시켜 더 큰 공간으로 쉽게 나아갈 수 없게 함을 아쉬워한다. 스스로 "내가 알고 있는 현실은 어느 이름 없는 방의 작은 모서리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라고 되묻는 작가의 말에는 바로 이 '모진' 모서리에 얽힌 인간적인 성찰이 배어있다. 우리의 한계는 고정되어선 안 될 테니 말이다. 타인에게 다가서고, '나'와 '나의 외부'가 화해하기 위해 작가는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댔다. 그동안 작가가 기록한 만여 장의 모서리 이미지는 바로 그 희망의 증거였고 그만큼의 열정이었다. 한편, 차주용은 이대영과는 다르게 자연현상에 대한 시각적 체험보다는 더욱 근본적인 조형 원리에 주목한다. 작가는 특히 면의 연결을 끊는 구획과 교차점인 모서리에 집중하면서 시각적 혼란을 제공한다. 한 점으로 모이는 벽의 여러 선과 면은 그것이 움푹 들어간 것인지 뾰족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아예 평면 상태인지 모호한 상태로 남는다. 작가는 불확정적인 공간을 제시하면서 인간의 시각이 이해하는 현상과 관념이 서로 충돌하는 장면을 냉정히 보여준다. 감상자들은 벽면을 가르는 선들의 고정적인 역할은 와해되어 사라지고 일루전(illusion)의 효과가 더해짐을 느끼게 된다. 작가의 전략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 우리의 사고가 자연으로서의 공간을 환영, 즉 일루전이라고 이해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작가는 반문하고 있다. 무엇이 환영이고 무엇이 시각 체험의 진실일까...? 매번 차원을 달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작가의 사진 이미지는 인식의 모순이 지정한 방향에 따라 선들이 구석으로 몰린 듯 보이거나 아니면 우리를 향해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혼란의 진정한 원인은 바로 우리의 인식인 것이다.

- 차주용_모서리#49_피그먼트 프린트_100×75cm_2015

- 차주용_모서리#50_피그먼트 프린트_100×75cm_2015

- 차주용_모서리#69_피그먼트 프린트_100×75cm_2015
독특한 사진전 『그어 가두다』는 가벼운 장식성과 표피적 낭만성에 치중하는 일련의 예술사진이 보여주지 못한 미학적 사유를 내세운다. 또한, 기성의 자유를 잠시 누리는 것만으로도 안심하려는 우리의 게으름을 꼬집는다. 인식의 한정된 명확함이 선사하는 달콤한 잠에서 깨서, 어렵지만 다시 한 번 익숙했던 것들을 바라보고 의심하고 또 그것을 렌즈에 담는다. '인공적 더함'이 없이 분명한 어조로 '갇힌 상태로서의 구획'을 의심한다. 조형적 기지(奇智)도 놓치지 않은 이러한 각성의 자세는 그래서 감상과 비평에서 올바른 평가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이 전시는 우리가 지닌 현재의 모순을 겸허히 인정하고, 감각의 날을 세우게 하여 인식과 자유의 개념이 앞으로 나가야 함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경계를 지우기 위해 경계를 드러내고,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한계를 인정하는 이번 2인의 사진전은 적어도 자연과 우리의 감정을 이어 붙이고 세계와 쌓은 케케묵은 대립을 중단하려 한다. ■ 이재걸
Vol.20151105h | 그어 가두다-이대영_차주용 2인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