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page
- ● archives
- ● restoration
- ● books
- ● big banners
- ● post board
- ■ neo's search
- ■ about us
- ■ 게재방법 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email protected]
- Tel. 02_335_7922
- Fax. 02_335_7929
- 10:00am~04:30pm
- 월요일~금요일
- 3/3(월) 대체공휴일

사소한 흔들림 Trivial Wavering
최희승展 / CHOIHEESEUNG / 崔希丞 / painting.installation 2015_0206 ▶ 2015_0225 / 월요일 휴관

- 최희승_untitled_리넨에 유채_60×45cm_2013
초대일시 / 2015_0206_금요일_06:00pm
관람시간 / 01:00pm~07:00pm / 월요일 휴관
갤러리 버튼 Gallery Button 서울 성북구 창경궁로 35길 83(성북동 1가 103번지) 1층 Tel. 070.7581.6026 www.gallerybutton.com
우리가 그랬듯 아이들은 아직 그림 속 하늘을 '하늘색' 크레파스로 칠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 하늘은 하늘색이 아니고, 연한 파랑이라는 대표색 이름이 있는데도 굳이 하늘색이라고 부른다. 하늘이 하늘색이 아닌 이유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지구의 대기와 대기중의 먼지가 만든 굴절과 난반사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누구나 안다. 우주를 구성하는 총 물질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암흑물질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종류의 전자기파로도 관측되지 않지만 중력을 통해서는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 보이지 않았고 관측되지 않았기에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었으나 다른 방식으로 존재가 증명되고, 그것이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알려진 후 비로소 우주의 시작과 끝, 팽창과 소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다. ● 그렇게 나와 내 주변 모든 것들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무엇'이 가득 차 있다. 그건 아주 작은 박테리아나 먼지일 수도 있고, 대기를 구성하는 물질일 수도 있다. 지구와 달, 멀게는 태양의 중력도 그 사이에 존재하며 작용하고 있을 것이며 전파와 음파도 에너지의 형태로 우리를 둘러 싸고 있을 것이다. 사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안온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무엇은 비단 물질적이거나 물리학 법칙에 의해 증명되는 존재만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오래 전 흐른 시간과 지구에 존재했던 수많은 존재들의 기억, 그리고 사방으로 뒤얽힌 감정과 관계들 또한 나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물 속에 사는 물고기나 진배 없는 모양새로 사는 셈이다. 물 속을 유영하며 사는 물고기처럼, 암흑물질 속에 떠있는 지구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 사이에 부유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체감하는 순간, 우리는 막 잠에서 깨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기 직전의 생경함과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꿈과 현실의 어지러운 경계에서 지금 내 손 끝에 닿는 낯선 이불의 촉감이, 뭔가 부옇게 흐려져서 낯설게 보이는 공간이, 실은 오랫동안 덥고 잠들던 바로 그 이불이며 그보다 더 오랫동안 살아온 익숙한 내 방이라는 사실을 차차 알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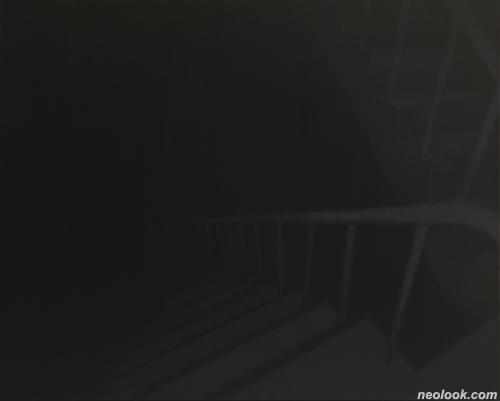
- 최희승_dark stairs II_리넨에 유채_130.3×162.2cm_2014
최희승의 작업은 일렁거린다. 형체는 알아볼 수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지만 또렷한 선도 명징한 선과 색도 사라졌다. 무채색의 이미지들이 향하는 지점도 모호하다. 틈으로 새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그것이 문임을 알게 하고, 어두운 복도의 계단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언뜻 보면 무채색의 단색화처럼 재현된 작품 속 공간은 지속된 불면이 꿈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듯 모호하다. 형태도 지향점도 온전히 내보이지 않는 이미지들은 묘하게 흔들린다. 어릴 적 본 만화에서 4차원 세계로 빠지는 주인공의 형체가 물결처럼 흔들리는 장면이 자꾸만 생각난다. 작품이 물속에서 하늘을 보는 것처럼, 볕이 좋은 봄날 먼 데서 아지랑이가 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최희승이 만든 공간에서 또렷한 경계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자다 일어나 아직 꿈이 현실을 지배하는 순간을 닮았다. 균형을 잃고 뒤틀려 모호해진 순간의 포착이다. ● 다만 최희승에게 중요한 것은 모호함 자체가 아니다. 존재와 존재, 나아가 시점과 시점 사이에 모호함을 불러일으키는 '무엇'이 있고, 그 '무엇'이 양쪽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사유하는 과정 중에 이 모호함이 재현되었다고 보는 편이 옳다. 최희승의 작품에 재현된 이 모호한 공간은 작품 속 계단의 시작과 끝,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가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암흑물질과 은하의 중력이 상호 작용하여 우주를 진화시키는 것처럼 존재와 존재, 시점과 시점 사이를 보이지 않는 관계들이 가득 채우고 변형시키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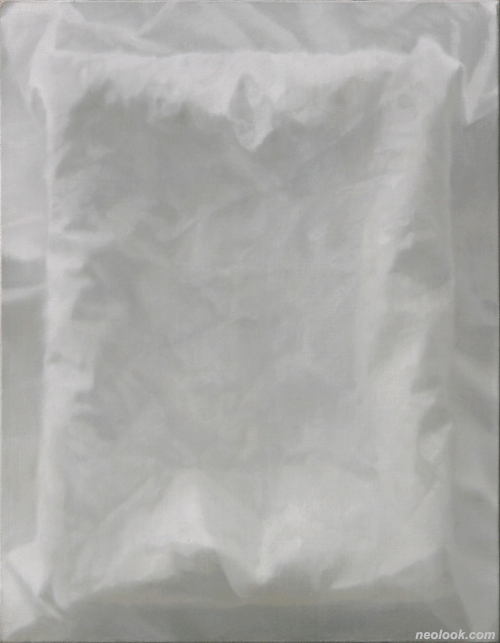
- 최희승_covered_리넨에 유채_40.9×31.8cm_2014

- 최희승_waves of a door_단채널 HD 영상_2015
최희승의 작업에 명징한 이미지들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은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 계단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문 뒤에 있는 공간은 대체 어떤 곳일지, 다른 이미지가 그려진 실크가 겹쳐져 만들어진 이미지는 대체 무엇인지, 작품 속에는 모호한 형태로만 남은 해답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꿈과 현실, 시간과 공간을 아울러 결국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오랫동안 그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관계가 얽혀 만들어낸 것이며, 지금도 변화하고 있으므로 훗날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게 될 지 알 수 없음을 은유하고 있는 것. 마치 같은 일을 겪은 두 사람이 서로 완전히 다른 기억을 가지게 되는 경우처럼 말이다. ● 프로이트의 말처럼 현실의 일상이 꿈의 재료가 된다면, 그래서 꿈과 현실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면, 꿈은 흔히 생각하듯 해몽을 통한 예지의 역할 뿐 아니라 삶을 되새겨 기억하고 반추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잠에서 떨 깨, 흠칫 놀라게 되는 것은 단순히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현실에 침투한 꿈이 익숙한 공간을 일순간 생경하게 만든 힘을 느꼈기 때문이고, 어쩌면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관계 맺고 있음을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두 세계의 관계가 방 안 공기를 뒤흔들고 비틀었을 때, 방 안 풍경은 마치 최희승의 작품 속 이미지처럼 모호하고 희미한 형태만 남아 있을 것이다. 삶을 가득 채운 기억들과 시간의 흐름,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명확하게 하는 관계 맺음이 역설적으로 작용하여 나를 지금과 다른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녀의 작업 안에 있다. 역시 최희승의 작업은 일렁거린다. ■ 갤러리 버튼

- 최희승_wrapped shoes_신발, 왁스_가변크기_2015
Every object and person lives in the continuity of relationships. There's relation between certain memory, smell, the air surrounding, the sound of the sheets and the touch of the pillow as one sleeps. We just don't realise those moments. As every moment is delicately related, the atmosphere and the balance will fall apart if one piece/time goes wrong. This atmosphere(air) is where the relations actually happen and it supports the spaces between. In the end it's not a person or an object that possesses the space, it's the space that allows a person or an object to relate in any form. This exchange is shown in my work as stairs or a ladder where changes are made, and sometimes expressed through that ambiguous boundary of sleep. Through my work, I try to think about 'being in relationship' with using a concept of space. ● Sometimes its shown with time element. We are continuously influenced by the past memories and experiences. This relation is a two way interaction, not one way. The past event is constantly changing as we speak. It forms to a memory and this memory forms to another. The endless formation gives the memory a new shape and a new explanation. The past event not only influences us but keeps on changing through us. ■ CHOIHEESEUNG
Vol.20150207c | 최희승展 / CHOIHEESEUNG / 崔希丞 / painting.instal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