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page
- ● archives
- ● restoration
- ● books
- ● big banners
- ● post board
- ■ neo's search
- ■ about us
- ■ 게재방법 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email protected]
- Tel. 02_335_7922
- Fax. 02_335_7929
- 10:00am~04:30pm
- 월요일~금요일
- 3/3(월) 대체공휴일

Time
강영길展 / KANGYOUNGKIL / 姜暎吉 / photography 2011_0728 ▶ 2011_0815
●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네오룩 아카이브 Vol.20070825f | 강영길展으로 갑니다.
초대일시 / 2011_0728_목요일_05:00pm
기획 / 가나아트
관람시간 / 10:00am~07:00pm
가나 컨템포러리 GANA CONTEMPORARY 서울 종로구 평창동 98번지 Tel. +82.2.720.1020 www.ganaart.com
강영길이 바라보는 것, 또는 곳 ● 머리 속 생각들을 이어주는 끈이 잠시나마 탁 끊어졌다. 비 오는 토요일 오후, 장흥에 있는 작가 강영길의 작업실 문턱을 막 넘어섰을 때였다. 오기 전 '붉은 전구가 있는 암실'과 같은 전형적인 사진 작업실을 상상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하지만 그곳은 상당히 생경한 풍경이었다. 작품들이 걸려있는 벽면 네 개가 만든 공간의 한 쪽에는 길쭉한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아이맥(iMac) 한 대가 난짝 올라가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작업도구라곤 하나 없는 작업실에서 작가와 나는 책상 앞에 나란히 앉아 반짝거리는 아이맥 화면을 통해 그간 작업해온 결과물들을 함께 보았다. 가끔씩 작가는 1.5리터짜리 물병으로 손을 뻗어 물을 마셨다. 혹시 그는 이 작업실에서 카메라 대신 1.5리터 물병으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

- 강영길_존재_D 프린트, 디아섹_200×133cm_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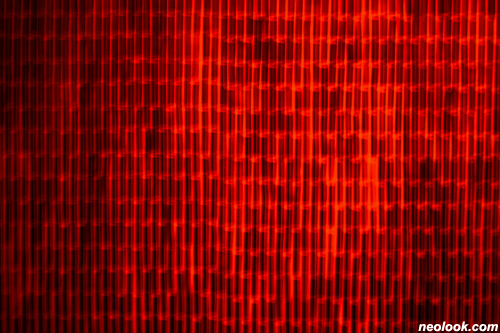
- 강영길_변주곡_C 프린트, 디아섹_180×270cm_2007
작업실은 작가의 머리 속 ● 2007년과 2009년 아트싸이드 서울 갤러리와 북경 갤러리를 통해 그가 보여주었던 대나무와 바다 그리고 수영장(이라고 내가 간단하게 줄여 부르는) 작업들은 현재도 진행형으로 자라고 변화하고 있다. 부드러운 맥킨토시 인터페이스를 통해 세 줄기 경향의 작품들을 짧은 시간 동안 모두 볼 수 있었다. 작품을 보면서 작가는 피사체로 선택된 사물과 풍경의 의미를 짤막하게 말해 주었다. 그의 작업들은 모두 '소멸'과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담고 있다. 그리고 작업들을 관통하는 이 맥락을 위해 표현은 최대한 절제된다. 소멸을 드러내는데 수사(修辭)는 필요 없다. ● 대개 작가들은 스스로가 선택한 주제와 이념 혹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종종 치열하게 반복적인 숙련을 거친다. 그래서 때로는 표현 그 자체가 전체인 것처럼 부각되기도 한다. '작가의 작업실'에 대한 내 고정관념도 일반적인 거였다. 그는 이런 경향에서 한 발짝 벗어나 있다. 작업과 작업실 모두. ● 그의 작업은 유유자적 산책하고,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숲을 바라보고, 바다를 찾아가서 한참을 앉아 있고, 또 훌쩍 어디론가 떠나는 거다. 그 과정에서 조우(遭遇)하는 감정과 형상과 장면들을 작가는 구체화시켜 화면에 붙잡아 놓는다. 이때 필요한 도구로 그가 선택한 것이 카메라다. 내가 찾아갔던 그 작업실은 작가 강영길의 머리 속이 확장된 형태였다.

- 강영길_존재_D 프린트, 디아섹_150×185cm_2011

- 강영길_존재_D 프린트, 디아섹_150×185cm_2011
세속적인 것의 숭고함 ● 그의 작품 '눈부신 외로움'(위에서 '수영장'이라고 했던)에 대해 작가는 '우연한' 발견이었다고 말한다. 동남아 여행 중에서 그는 강렬한 햇살이 내리 쪼이는 수영장을 찾았다. 함께 간 지인이 물살을 가르며 수영하는 모습에서 그는 마치 '현실에서 분리되어 버린 것 같은 슬픔'을 느꼈다. 찬란한 햇살과 고독한 수영이라는 대비에서 작가가 느낀 감정은 카메라 렌즈와 CCD(Charge Coupled Device 촬상소자)와 메모리 그리고 프린터를 통과해 작품 평면 위로 고착되었다. 나는 이 작품 앞에 서면, 몸 속에 들어있던 특정 체액이 몸의 특정 기관을 통해 쑥 빠져나갈 때 느끼는, 끝 모를 허무가 밀려온다. ● 그런데 그의 작품은 과연 '우연히' 이루어진 걸까? 아무나 '세속적인 것의 숭고함(sublimity of the mundane)'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통찰은 모든 사물에 깃들어 있는 매우 놀랍고도 의미심장한 아름다움을 감지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이에 대한 사례로 아르키메데스, 피타고라스, 존 틴달, 스젠트 기요르기 등 수학자와 과학자, 그리고 머스 커닝햄, 르네 마그리트, 마르셀 뒤샹과 같은 예술가들을 꼽는다. 요약하자면, 물체의 길이가 음의 높낮이와 관련이 있음을 처음 알아낸 것은 대장장이가 아니라 대장장이의 망치질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있던 피타고라스였다는 거다. 모든 사물과 현상에는 숭고함이 있지만 통찰력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 미셸 루트번스타일, 생각의 탄생, 박종성 옮김, 에코의서재, 2007, p.69~74)) 때로는 하찮게까지 여겨지는 사물과 사건에 대해 감성적인 통찰을 하는 게 그에게 있어 창작이다.

- 강영길_존재_D 프린트, 디아섹_150×185cm_2011

- 강영길_존재_D 프린트, 디아섹_150×185cm_2011
직관으로 바라본 세계 ●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렇듯이 통찰은 직관에서 시작된다. 직관은 매우 아름다워서 학습과 탐구에 의해 습득된 것들과는 차이가 있다. 직관이 주는 쾌(快)는 예술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거시와 미시를 다루는 물리를 비롯한 과학에서도, 심지어는 주식시장에서도 직관은 아름답다. 케플러는 그의 두 번째 법칙, "한 행성과 태양을 연결하는 동경(動徑)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면적을 쓸고 간다"라는 아름답고 명쾌한 명제를 오로지 직관으로만 감지했다고 한다. (행성운동에 관한 '케플러의 법칙'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중 두 번째 법칙은 이전까지 천문학에 있어서 이론과 관측 사이에 존재했던 불일치의 대부분을 해소하게 해주었다. 그런데 이 발상은 케플러의 머리 속에서 직관으로만 남아 있었다. 그는 이것이 옳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째서 그러한지를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했다. (찰스 밴 도렌, 지식의 역사, 박중서 옮김, 갈라파고스, 2010, p.449~452)) 직관 없는 과학자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직관 없는 작가는 매일 보는 우리 주변의 생활인에 가깝다. ● 작가 강영길은 직관으로 세계를 본다. 그의 대나무 작업에서 주제는 대나무 숲이 있어야 할 곳에 대신 자리잡고 있는 어둠이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모든 존재에 대한 성찰을 그는 말하고 싶어한다. 이를 위해 해질녘이거나 아니면 그 바로 직후의 시간에 대숲을 찾는다. 그가 찾는 것은 대나무의 조형성이 아니다. 처음 대나무 작업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작품에서 형태는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대신 그 자리를 빈 공간이 차지한다. 아마도 이번 전시에는 볼 수 없을 지 모르는, 바다 작업에 대해 작가는 말한다. 경계가 무너진 영원의 영역을 시간이 그려냈다고. ● 그는 하늘과 구분되지 않는 바다 앞에 앉아서, 혹은 어둠 속으로 형태가 사라지는 대숲을 바라보면서 곧 과거가 되어버릴 그리고는 소멸할 현재의 시간을 측은한 눈빛으로 떠나 보낸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의 손가락 끝만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작가 강영길의 작품에서 대나무 혹은 수평선만 주시한다면 그것은 마치 달 대신 손가락만 바라보는 것일 겁니다. (오색동행 - 하인두 선생 가족전 서문 중)) ■ 이승환
Vol.20110728b | 강영길展 / KANGYOUNGKIL / 姜暎吉 / photograph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