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page
- ● archives
- ● restoration
- ● books
- ● big banners
- ● post board
- ■ neo's search
- ■ about us
- ■ 게재방법 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email protected]
- Tel. 02_335_7922
- Fax. 02_335_7929
- 10:00am~04:30pm
- 월요일~금요일
- 3/3(월) 대체공휴일

풍경의 은유
김성묵展 / KIMSEONGMOOK / 金聖黙 / photography 2010_0929 ▶ 2010_1019

- 김성묵_풍경의 은유_C 프린트_67×101cm_2010
별도의 초대일시가 없습니다.
2010_0929 ▶ 2010_1008 관람시간 / 10:00am~06:00pm
모인화랑_Moin Gallery 서울 종로구 관훈동 30-9번지 2층 Tel. +82.2.739.9292 www.moingallery.co.kr
2010_1013 ▶ 2010_1019 관람시간 / 10:00am~06:00pm / 월요일 휴관
강릉미술관 GANGNEUNG MUSEUM OF ART 강원도 강릉시 교1동 904-14번지 Tel. +82.33.655.9600 www.gnmu.org
물 속에 잠긴 집, 수면에 자기를 반영하는 집 ● 추사 김정희가 그린 그림 중「세한도」가 있다. 화가가 제주도 유배시절 그린 그림으로, 헐벗은 노송 몇 그루가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자신이 기거하던 초막을 그린 그림이다. 허허로운 화면과 갈필로 그려진 그림이 문인화 고유의 문기와 격조를 풍기며, 소소한 아취와 쓸쓸한 정취가 배어난다. 비록 그림 속에 화가는 없지만, 그림 속 초막이 화가를 대리한다. 요새 식으로 가택연금 형에 처해진 화가의 신세를 생각하면, 이런 식의 해석은 더 설득력을 얻는다. 일종의 암시적인 방법으로써, 부재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써 화가와 초막의 동일시를 실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 속 초막을 보면서 당시 화가의 가시적인 형편과 비가시적인 심경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 ● 흔히 낯 설은 집, 외딴 집, 음울한 집, 햇살 밝은 집, 뿌리 깊은 집이라고들 한다. 이처럼 집은 그저 집이 아니다. 단순한 사물 이상의 어떤 성격을 내재하고 있는 집이며, 어떤 정조를 불러일으키는 집이다. 캐니와 언캐니. 나에게 집은 친근하지만, 동시에 타자에게 그 집은 낯설다. 집은 항상 어떤 정조를 내장하고 있다. 그 집 속엔 한 개인이, 한 가족이, 한 사회가 기거한다. 집은 곧 그 개인을, 그 가족을, 그 사회를 대리하는 정체성의 메타포다. 그리고 그 메타포는 시간과 역사의 메타포로까지 확장된다. ● 김정희가 세한도에 등장하는 초막 속에 자신의 기질과 심경을 투사했듯, 김성묵은 자신이 직접 제작해 만든 집 모형(공교롭게도 그 집 모형은 세한도 속의 초막을 닮았다. 아마도 집을 이루는 최소한의 구조가 서로 닮았을 것이다)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담아 스스로를 대리하게 했다. 그 집은 말하자면 그저 집이 아니라, 작가의 정조가 담겨진 집이며, 그 정조와 더불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내장된 집이다. 결국 작가가 그 집에 담아놓은 정조와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 관건일 것이며, 그저 집이 아니라 어떤 집인지를 읽어내는 것이 결정적일 것이다.

- 김성묵_풍경의 은유_C 프린트_67×101cm_2010

- 김성묵_풍경의 은유_C 프린트_45×76cm_2010

- 김성묵_풍경의 은유_C 프린트_51×76cm_2010
김성묵은 집 모형을 만든다. 가녀린 나무막대를 얼기설기 엮어 만든 그 집은 사통팔방이 뚫려있는, 최소한의 구조로 환원된 집이며, 최소한의 기호로 치환된 집이다. 작가는 그 집을 들고 다니다가 적절한 풍경을 만나면, 그 풍경 속에다 그 집을 자리하게 하고, 그 집을 포함한 정경을 사진으로 옮긴다. 비록 그 집을 들고 다니고 적절한 자리를 찾아 놓는 것은 작가지만, 보기에 따라선 집 자체가 그렇게 하기 위해 작가를 도구로 쓰는 것 같은, 집의 의지가 발휘된 것 같은 인상을 준다(사진 속에 작가는 없다. 작가는 말하자면 비가시적인 형태로 집 속에 담겨진 것이며, 집과 더불어 여행을 하고 있는 것). 말하자면 집의 여로로 명명할 만한, 집이 머물다간 자리를 추적하고 역추적한 것 같은 느낌이다. ● 이렇게 숲 속에, 이름모를 들풀들 속에 마치 그 숲의, 그 풀의 일부인 양 자리하고 있는 집, 무슨 주춧돌이나 되는 마냥 돌무더기 위에 자리 잡은 집, 돌담 위에 자리해 경관을 구경하는 집, 넝쿨식물에 의지해 허공에 매달려 있는 집, 나뭇가지 위에 부유하듯 가볍게 자리한 집, 개울에 자리한 집, 수면에 또 다른 자기를 반영하는 집들이 보인다. 이와 함께 수풀을 찍은 사진을 덧대 만든 집 모형이 흡사 그것이 자리한 수풀의 일부로 동화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 이 일련의 집들이 서정적이고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며, 그 느낌은 일련의 디지털 프로세스를 거친 작업들에서 더 심화되는 국면을 맞는다. 주로 바다의 수면을 풀사이즈로 잡은 화면 속에다 집 모형을 포치한 작업들로서, 심플한 화면구성이 미니멀리즘을 연상시키고, 세계의 원초적 풍경과 대면한 것 같은 아득하고 막막한 느낌을 준다. 그 원초적 풍경을 저 홀로 지키고 있는 집, 자기, 존재, 정체성. 발가벗은 세계와 발가벗은 존재의 만남. 인식의 프리즘을 벗어던진, 존재론적인 만남. ● 이 만남, 이 느낌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아마도 바다 때문이 아닐까 싶다. 특히 작가의 화면에서처럼 풀사이즈로 바다를 잡을 때, 그 바다는 그 끝을 가늠할 수가 없게 만든다. 그 끝을 가늠할 수 없음. 그 끝을 인식할 수 없음. 인간의 인식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바다. 바다가 유별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바다는 세계가 유래할 때의, 까마득한 전설을 망각의 물 속에다 풀어 놓고 있다. 일렁이는 수면을 쳐다보고 있으면, 바다가 품고 있는 그 전설의 자락들이 무슨 해초처럼 수면 위로 나왔다가 잠수하기를 반복하는 것 같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이야기, 그 전설의 잔영(바다는 실체라기보다는, 실체가 남겨준 잔영 같고 환영 같다) 위로 집이 저 홀로 떠다니고 있다. 무상한 존재가 부유하고 있다. ● 작가는 바다가 고향이다. 그래서 그런지 작가의 작업 속엔 유독 바다가 많고, 또 그 바다들이 하나같이 자연스럽다. 근작에서의 사진작업 역시 그렇지만, 사실 바다는 진즉에 작가의 작업 속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 이를테면 전작에서의 회화 작업에서 작가는 그 끝을 헤아릴 수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검푸르거나, 투명하면서 푸르스름한 바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자기를 그려놓거나, 자기의 상념을 중첩시켜놓고 있다. 이렇게 중첩된 자기와 자기의 상념은 바다와 구별되지가 않는다. 내가 대면하고 있는 바다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바다가 구별되지가 않는다. 아마도 작가가 이처럼 바다를 그리고 사진 찍는 것은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 유래한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일종의 회귀의식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 그런데, 바다로 돌아간다는 것,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때의 바다와 고향은 그저 지리적 의미이며 지정학적 의미에 지나지 않은 것일까. 바다가 고향이라고 했다. 그리고 바다는 실체로서보다는 그 실체가 남겨준 잔영 같다고도 했다. 바다는 관념이다(바다라는 관념). 고향도 관념이다(고향이라는 관념). 실체는 없고 그 실체가 다만 관념으로만 남겨진 것들이 바로 바다며, 고향이며, 원형이다. 현대인에겐 일종의 유목민의식(그 자체로는 떠나고 싶은 욕망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욕망은 동시에 되돌아가고 싶은 욕망 곧 회유본능과도 통한다. 말하자면 그는 자신이 유래한 곳 곧 근원으로 떠나고 싶은 것이다)이 내장돼 있으며, 따라서 그가 떠나온 바다에 대한, 고향에 대한, 원형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으로 아프다. 현대인의 질병이다. 바다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회귀하는 작가의 행위(혹은 최소한 기획)는 이처럼 그 행위를 통해 상실된 것들을 되찾고 싶고, 이로써 그 상실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싶은지도 모를 일이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작가와 마찬가지로 현대인이면 누구든 공유하고 있는 질병임을 생각하면, 작가의 작업 혹은 기획은 작가의 경계를 넘어 보편적인 가치를 얻는다.

- 김성묵_풍경의 은유_C 프린트_51×76cm_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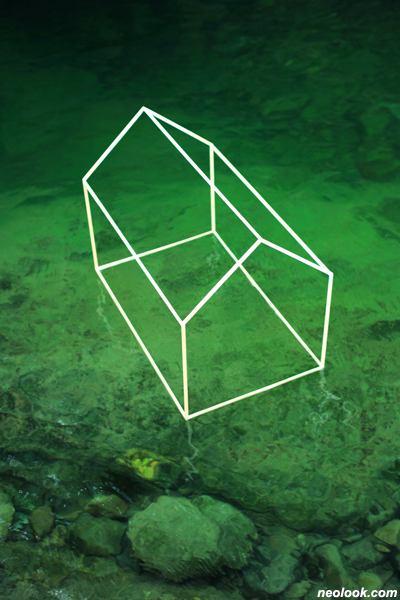
- 김성묵_풍경의 은유_C 프린트_76×51cm_2010
이외에도 작가는 일종의 이중화면을 시도한다. 사진과 그 표면에 회화적 작업으로 리터치를 부가한 또 다른 사진을 병치시킨다든지, 사진과 컴퓨터 프로세싱을 통해 변형시킨 또 다른 사진을 대비시킨 작업들이다. 사진 속 소재들은 작가의 다른 작업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집들이 많으며, 집이란 똑같은 소재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매개로 두 화면이 형식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 서로 연결되게 했다. 이를테면 동일한 청색 계열의 색조가 하나의 화면에선 집을 감싸고 있는 하늘로 나타나고, 병치되는 또 다른 화면에선 그 속에 바다를 머금고 있는 집 형상으로 현상하는 식이다. ● 이 일련의 작업들에서 집은 대개 바다, 수면, 물과 만난다. 이를테면 물속에 잠긴 집, 물 위에 부유하는 집, 물 위에 자기를 반영하는 집 등 집과 물이 하나로 어우러져 만든 풍경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내보인다. 그렇게 열린 풍경은 비록 현실적인 모티브를 소재로 한 것이면서도 어느 정도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초현실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연으로부터 길어 올려진 무의식의 풍경처럼 보인다(모든 무의식의 밑바닥에는 심연이 흐르고 있고, 바다는 바로 그 심연의 은유적 표현에 다름 아니다). 풍경의 실제를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풍경의 은유(은유적 표현)를 실현하고 있다고나 할까. ● 이로써 작가의 작업은 정체성의 메타포로서의 집과, 존재론적 원형의 메타포로서의 물의 의미가 하나의 결로 짜여진 경우로 볼 수 있겠고, 이를 계기로 보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근원과, 무의식과 대면하도록 이끈다. 그 무의식의 바다 한 가운데로부터 꿈꾸는 집과 만나게 하고, 아득한, 혹 잊혀진, 혹 억압된 전설(세계의 처음에 대해 말해줄, 망실된 서사)의 한 자락을 복원하게 만든다. ■ 고충환
Vol.20100930e | 김성묵展 / KIMSEONGMOOK / 金聖黙 / photograph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