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page
- ● archives
- ● restoration
- ● books
- ● big banners
- ● post board
- ■ neo's search
- ■ about us
- ■ 게재방법 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email protected]
- Tel. 02_335_7922
- Fax. 02_335_7929
- 10:00am~04:30pm
- 월요일~금요일
- 3/3(월) 대체공휴일

The landscape of memory
한동호 회화展 2007_1212 ▶ 2007_1218
●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노암갤러리 홈페이지로 갑니다.
초대일시_2007_1212_수요일_06:00pm
노암갤러리 서울 종로구 인사동 133번지 Tel. 02_720_2235 www.noamgallery.com
자아(自我)를 찾아가는 선묘(線描) ● 작가 한동호의 화폭에는 대기를 가득 채우는 어지러운 선묘(線描)가 가득하다. 동양화의 본질적 조형 요소로서의 선(線)의 의미를 굳이 대입시키자면, 동양화를 전공한 이들의 공통적이며 고질적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일단 표출된 셈이다. 그러나 그의 선묘는 훨씬 더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 멀리서 보는 그의 그림은 평화롭고 고요하기 그지없다. 담박(淡泊)한 수묵의 선이 스칠 듯 말 듯 옮겨간 자욱들은 미완의 드로잉을 보는 듯한 느낌마저 준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 선 순간, 엄청난 공력으로 하나하나 그어나간 복잡한 필선들의 조합을 마주하게 된다. 근거리(近距離)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그 완성도 있는 화면은 조망하는 거리나 각도에 따라 너무나 다른 모습을 가진, 오해와 착각이 가득한 이 세상과도 닮아있다. ● 실제로 작가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없이 평화롭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속속들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을 화폭에 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화면 공간을 채운 하나하나의 선은 구도자(求道者)의 자세처럼, 현실도피적인 생각과 고통스러운 수행 과정을 함께 담으며 복잡한 세상과 마음을 비워내는 방편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떠나고 싶은 공간의 표현과 떠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려는 일련의 몸짓으로서의 얇은 철선들이 화면 속에서 일렁이는 것이다.

- 한동호_그 해 봄_혼합재료_20×160cm_2007
그리고 그 위에 다소 설명적이기는 하나, 세상 속 자아(自我)의 구체적 형상화(形象化)가 등장한다. 그것은 선묘의 바탕 위를 날아가는 한 마리 새이다. 인간 존재의 외로움에 대한 단상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듯, 갈매기인지 까마귀인지 모를 그 새는 제 짝, 또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날아가고 있다. 이동하는 새의 형상은 무리를 짓기도 하는데, 이것은 "나 자신"이자 "나의 생각들"의 표상이라고 작가는 밝힌 바 있다. 굳이 종류를 구분하자면 갈매기인 이 새는, 작품의 화면이 보는 이의 거리에 따라 느낌을 달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양면성을 가진 새이다. 멀리서 볼 때는 그 실루엣이 청아하고 부드러우며 자유로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본 갈매기는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맹금류(猛禽類)의 형상을 띄고 있다. 이 세계와 구성원들의 다면성에 관한 작가의 생각이 기법면, 소재면에서 함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이중성과 다면성은 단순한 흑백 논리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여간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의 이 익숙하지 않은 화면은 미완성의 화면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모노크롬(monochrome) 회화가 주는 것과 비슷한 매력이 있다.

- 한동호_기억 속의 풍경_혼합재료_45×90cm_2007
가까이 다가서야만 경험할 수 있는 기법상의 특이점이 한 가지 더 있다. 화폭의 표면을 덮고 있는 퍼티(Putty)가 바로 그것이다. 이 미디움(Medium)은 흔히 건축용 외벽 마감재로 쓰이는 재료로, 건조된 화면위에 미세한 질감(Matiere)을 형성할 뿐더러, 아무런 상념 없이 긋는 선에 의도되지 않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면에서 효과를 얻고 있다. 이는 그의 작품에서 가장 아쉬운 점인 강약의 변화를 소극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선의 굵기와 진하기의 변화마저 화면의 약한 굴곡에 의한 우연성에 맡기는 그를 보면, 무심(無心)한 마음속의 작화 방식을 너무나 의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 이러한 바탕재를 쓴 또 하나의 이유는 많은 현대 한국화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것, 작가의 표현을 빌자면, "전통에 대한 탈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 전통을 탈출함과 넘어섬은 바로 그 전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디딤으로써만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이제 다시 그의 특색 없는 특색을 가진 선묘의 근원에 대해 조금 더 파고 들어가 이야기해 보겠다.

- 한동호_기억 속의 풍경_혼합재료_45×90cm_2007
그의 선은 전통 산수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변화 있는 준(?)이 아니라, 불화 초본(草本)의 전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굵기 일정한 얇은 철선(鐵線)에 가깝다 하겠다. 과거, 그가 그림을 진지하게 공부했던 학창시절, 꾸준히 모사해 왔던 대가(大家)들의 작품들과 불화 초본들이 이러한 선묘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전이모사(轉移模寫)가 화육법(畵六法)의 출발점이 되듯이, 그의 창작의 기저에는 이러한 기본적 측면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작가 역시 그림의 기초(基礎), 초심(初心)의 표현으로서 선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노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 그는 변화를 추구하되 고향과도 같은 동양화의 본질을 분명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 대부분의 작가들이 홀로이 수많은 여행, 산행을 통해 작품의 영감과 자료를 얻곤 한다. 그 역시 그러한 보편적인 작업 과정을 거쳐서 주제와 소재를 구해오지만, 영감을 주는 풍광들을 오로지 마음에만 담아서, 사진이나 스케치를 참고하지 않고 상상화를 그리듯이 배경을 그려내었다는 점은 그 결과물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아카데믹한 면에서는 필시 멀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원작(原作)을 대하며 마음속에 투사된 느낌을 따라가서 그 배운 점을 보지 않고 그려낸다는 방작(倣作)의 의미를 생각해본다면, 기억 속의 풍경을 그리는 그의 작화 태도는 전혀 근원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남 저수지나 남이섬의 물안개를 담은 그의 담담(淡淡)한 화면은 분명, 자연이라는 대가(大家)에 대한 감흥을 담은 방작인 것이다.

- 한동호_새들_한지에 먹_200×610cm_2007_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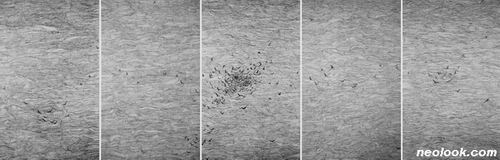
- 한동호_새들_한지에 먹_200×610cm_2007
일 년여 전, 작가로서의 출발선에 섰던 그의 작품들로 잠시 돌아가, 오늘의 작품들과 비교해 보자면, 그 짧은 시간동안의 고민과 변화가 얼마나 심했었던가를 알 수 있다. ● 2006년 5월 『동양화 새천년』展에 출품했던 그의 작품들 속에도 역시 날아가는 새와 끊임없이 이어지는 물결의 선묘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작품들보다는 선묘가 훨씬 구체적이고 곡선으로 굽이치는 부드러운 형상을 띄고 있었다. 현재의 작품들 속의 선이 훨씬 경직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작가가 그간의 심적 변화를 거르지 않고 나타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혼돈 상태에서 나를 찾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역경과 변화, 갈등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 과정에서 가끔은 감추어도 좋을 것을 드러내고 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작가가 고민과 사색을 멈추지 않는 한, 자연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리라 본다. ● 그리고 고요하고 차분한 듯하나,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감성이 살아 숨쉬는 작가의 성품이 더욱 정제되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무심하려고 하나 결코 무심한 수 없는,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은 부조리한 세상사의 이야기들, 외로움에 대한 실오라기 같은 단어들의 조합이 이상향으로 날아가는 화면 속 새들처럼 희망적으로 펼쳐지길 바란다. 희노애락(喜怒哀樂)에서 멀리 떨어져 처연(處然)하고프나 그 속에서 숨쉬면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아처럼 말이다. ■ 유윤빈
Vol.20071212f | 한동호 회화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