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page
- ● archives
- ● restoration
- ● books
- ● big banners
- ● post board
- ■ neo's search
- ■ about us
- ■ 게재방법 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email protected]
- Tel. 02_335_7922
- Fax. 02_335_7929
- 10:00am~04:30pm
- 월요일~금요일
- 3/3(월) 대체공휴일

동두천 레지던스프로젝트 종합보고전
고승욱_김상돈_이지아展 2007_1025 ▶ 2007_1031
●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프로젝트스페이스D 블로그로 갑니다.
초대일시_2007_1025_목요일_04:00pm
후원_경기문화재단(시각예술 활성화 사업 공간재생프로젝트)
스텝_백종옥(기획)_임국화(코디네이터)
관람시간 / 01:00pm~06:00pm
프로젝트스페이스D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동 588-19번지 Tel. 010_7791_9658
도시와 주민, 그리고 미술: 동두천이라는 피사체가 꾸는 꿈 ● 도시는 기억의 창고이다. 환등기에 비치는 그림자들처럼, 현대의 도시는 어른거리는 불빛 너머, 물속에 잠겨 사라진 고대 도시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오늘날 도시는 설계자와 거주민이 빚어내는 욕망의 서사이기도 하다. 설계가 직선이라면 거주민의 삶은 곡선이다. 삶이 그려내는 곡선은 직선과 교차하면서 다른 무늬들을 만들어낸다. 이게 바로 도시의 기억이고, 그 기억의 모양새를 온전히 닮은 공간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은 지워지고, 공간은 그 기억의 흔적들을 간직한 텍스트로 남는다. 폐허의 기억. 그러나 그 폐허야말로 우리가 마주해야할 예술의 숙명이다. 도시의 기억을 현재로 다시 불러들이는 일은, 그러므로 공간을 다시 짜는 일이기도 하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작가들이 뭉쳤다. 이 작가들의 눈길을 끈 대상은 바로 '동두천.'김명인 시인은 시집 "동두천"에서 "바라보면 저다지 웅크린 집들조차 여기서는/ 공중에 뜬 신기루 같은 것을"이라고 노래했다. 김명인 시인의 뇌리 속에 남아 있는 도시, 이 "공중에 뜬 신기루 같은" 동두천을 이들은 어떻게 상대하겠다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두천 레지던스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하나의 과정'에 내가 참여한 동기는 이런 궁금증 때문이었다. 동두천은 기지촌이다. 말하자면, 미군부대라는 한국 근대사의 징표를 떼어놓고 동두천의 기억을 호명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 역시 미군부대를 끼고 있는 기지촌 주변에서 태어나서 자랐기에, 처음 동두천을 방문했을 때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꼈다. 물론 이런 느낌은 '친숙함'이 아니다. 내가 느낀 건 과거에 묻혀 있던 것들이 돌연 현재로 불려나올 때 발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었다. 그건 낯선 익숙함이기도 했다. 「동두천 레지던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들은 이렇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과거를 위해 모종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고승욱, 김상돈, 이지아, 이렇게 세 명의 작가들은 동두천이라는 집단 기억으로 내려간 광부들이었다. 그 깊은 탄맥에서 이들은 무엇을 찾아냈던 것일까?

- 고승욱_60-70년대 주한미군이 기록한 동두천 풍경의 재구성 1_2007

- 고승욱_60-70년대 주한미군이 기록한 동두천 풍경의 재구성 2_2007
먼저 고승욱을 보자. 그는「상패동 공동묘지 공원화 프로젝트」를 시도했다. 상패동 공동묘지는 동두천의 과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죽음은 소멸이지만, 그 죽음이 남긴 묘지와 비석은 과거를 증언하는 하나의 텍스트다. 고승욱은 이 폐허의 텍스트에 독자를 불러 모으려고 한다. 독자는 이 텍스트를 보고 과거의 동두천에서 현재의 동두천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의 의도다. 그가 죽음의 기억에서 삶의 의미를 길어 올리려고 생각했다는 것이 참으로 신선했다. 물론 이런 거창한 의미부여에 그는 겸연쩍어할지도 모르겠다. 그가 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동두천의 기억에 모두 동참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 곧 '사건'일 뿐이다. 공동묘지는 동두천을 거쳐 간 삶의 흔적이 남은 상징 공간이다. 고승욱은 이 공간의 상징성을 그대로 두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이 상징성을 높은 곳에서 끌어내려서 일상이 머무는 땅 위에 두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는 공동묘지 곳곳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길과 수목의 배치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그는 알고 있었다. 공간을 다시 짜는 일이야말로 기억의 편린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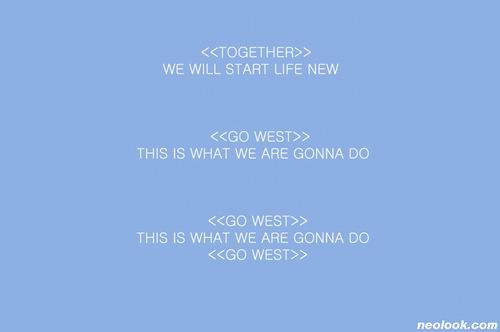
- 김상돈_go west_음향, C 프린트_20×25cm_2007

- 김상돈_go west_음향, C 프린트_20×25cm_2007
고승욱과 달리, 김상돈의 작업은 동두천의 미래에 더 주목한다. 김상돈에게 동두천의 미래는 과거를 복원하는 기준 노릇을 한다. 그에게 중요한 건 동두천이 닮아가려는 것에 대한 고찰이다. 그는 동두천의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의 꿈을 바꾸어보고 싶어 한다. 그는 관찰자다.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세파를 멍하니 보고 있는 관찰자가 아니라, 관찰을 일목요연하게 재편집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각성'의 순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실험가다. 그는 사진기로 사물과 공간을 찍고, 그것을 재배치한다. 그는 모사물의 구조를 잘 알고 있다. 그 구조야말로 욕망의 배치라는 걸 말이다. 그는 파주를 찍고, 양주를 찍고, 미군부대를 찍는다. 그가 찍는 건 단순한 피사체라기보다, 그 피사체가 꾸고 있는 꿈이다. 그가 찍어낸 이미지들은 찍히는 순간부터 피사체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이미지들의 독립선언. 이렇게 그가 만들어낸 이미지들은 피사체와 꿈 사이에 틈을 만든다. 이 틈이야말로 그의 작업이 깃들 둥지다. 그의 이미지들은 '주민들'을 필요로 한다. 그는 아무 것이나 찍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하는 행동들의 양식을 찍는다. 동두천이 움직이는 양식, 그게 그에게 미래를 보여준다. 그는 이렇게 발견한 미래를 우리에게도 보라고 말한다. 그 미래에서 '동두천다운 것'을 발견해야한다고 말한다.

- 이지아_스케치1-1 (신천징겅다리)_디지털 이미지_2007

- 이지아_스케치2-1 (상패동공동묘지)_디지털 이미지_2007
마무리는 이지아의 작품 속에서 움튼다. 이지아는 현재의 동두천에 관심을 갖는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징검다리. 그래서 그는 신천의 징검다리를 주목하는 것일까? 그에게 징검다리는 단순하게 강을 건너는 용도만을 갖지 않는다. 이 순간 다리의 기능은 새로운 차원을 획득한다. 이건 확실히 상징적이지만, 동시에 현실적이다. 현실성에 굳건히 뿌리박은 그의 작업은 징검다리를 통해 동두천의 과거와 미래를 돌아보게 만들 계획을 세운다. 신천은 청계천이 아니다. 한국의 모든 하천을 청계천처럼 만들고 있는 '토건왕국'의 신화에 이지아는 도전한다. 동두천을 흐르는 신천은 그냥 신천일 뿐이다. 특이성의 기입을 발견하기 위해 그는 징검다리를 건넌다. 그에게 징검다리는 무엇일까? 그에게 신천은 무엇일까? 가감 없이 질문한다면, 신천은 어떻게 청계천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이지아의 작업은 이런 낭패스러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이다. 그건 묵묵히 과거에 흘렀던 기억의 강이 오늘에도 흐르고, 내일에도 흐를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일이다. 거울은 현재를 비추고, 색채는 다채롭게 지나가는 일상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야기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내일도 있을 것이다. 이게 이지아의 미학인 것 같다. 그의 귀는 언제나 '이야기'를 향해 열려 있는 것 같다. 그의 작업도 고승욱과 김상돈의 그것처럼 '주민들'이 필요하다. 징검다리를 건너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할 이들은 그 누구도 아닌 동두천의 오늘과 내일을 살 '동두천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내가「동두천 레지던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 여러모로 행운이다. 기억은 탄맥처럼 공간에 숨어 제 속을 묵히지만, 그것을 캐내어 따뜻한 불길이라도 머금게 해줄 이들은 바로 예술가들이다. 특히 미술은 언제나 시공간의 문제가 아니었던가? 미술계의 곤궁을 나날이 목도하는 요즘, 이런 프로젝트와 이런 작가들의 존재는 한국 미술의 앞날을 밝게 하는 일이다. 시장에 묻혀 시장논리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슬픈 미술이 아니라, 이렇게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의 말처럼,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서 당대의 현실과 호흡하고 씨름하는 미술이야말로 보편적 예술성을 획득할 수 있는 실체다. 이런 작업과 노력이 있기에 미술은 여전히 현실의 꿈을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꾸는 꿈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은 동두천이지만, 내일은 다른 어느 곳일 것이다. 동두천은 동두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동두천이라는 특이성이 공간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걸 나는 확신한다. ■ 이택광
Vol.20071027d | 동두천 레지던스프로젝트 종합보고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