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page
- ● archives
- ● restoration
- ● books
- ● big banners
- ● post board
- ■ neo's search
- ■ about us
- ■ 게재방법 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email protected]
- Tel. 02_335_7922
- Fax. 02_335_7929
- 10:00am~04:30pm
- 월요일~금요일
- 3/3(월) 대체공휴일

사진의 쾌樂
책임기획_김남진_이경률 2007_0905 ▶ 2007_1002
●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아트비트갤러리 홈페이지로 갑니다.
초대일시_2007_0905_수요일_06:00pm
아트비트갤러리 개관기념전
아트비트갤러리 서울 종로구 인사동 156번지 성보빌딩 301호 Tel. 02_722_8749 www.artbit.kr
지금의 우리 사진은 어디쯤 와 있고, 앞으로의 한국 사진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다소 거창하지만 질박한 질문으로부터 이번 전시는 출발한다. 한국 사진계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젊은 사진가들의 작업 성향과 작품의 견실성을 탐색해보지 않을 수 없다. 즉 앞으로의 우리 사진의 기간을 형성하는 인프라infrastructure를 점검해 보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보자고 했다. ● 따라서 기존의 유행의 범주에 머물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사진 문법으로 차별성과 변별성 있는 작업을 지향하고 있는 작가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새로운 젊은 작가들의 선정 기준이나 그 과정에는 항시 어려움과 오류라는 시행착오가 뒤따르지만 앞으로의 한국의 현대사진을 정의하는 새로운 키워드를 지닌 작가의 존재 가능성 또한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 '사진의 쾌樂'전에 참여하는 13명의 젊은 작가들의 생물학적인 연령이 20~30대 작가들로써, 참여 작가 다수는 나름대로 제 분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작가들이다. 이들 작가들의 다양한 작업 양상에서 비슷한 색깔과 다루는 주제의 무게감으로 굳이 분류하여 그들의 존재를 알리면서 우리 사진의 깊이와 넓이를 검토해보고 더 나아가 다양성을 확장하고자 한다.
신체 - 여성과 강요되는 몸
고상우_서대승_정소영展 2007_0905 ▶ 2007_0911

- 고상우_Lady in green rose_디지털 프린트_120×90cm_2006

- 서대승_Korean Pregnant Women_디지털 프린트_100×135cm_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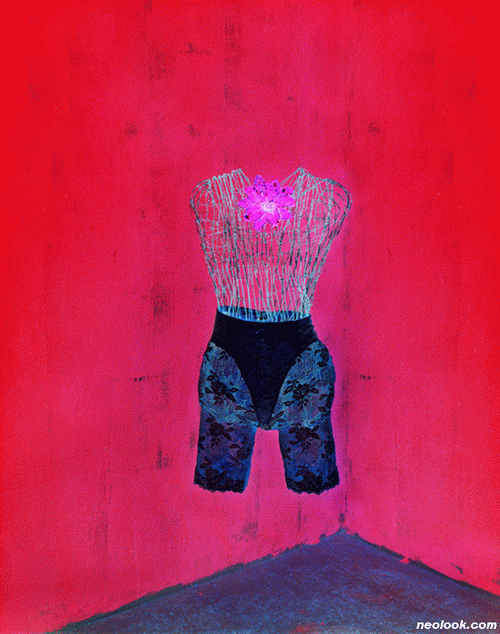
- 정소영_황금빛 새장_디지털 프린트_120×160cm_2006
사진적 주제는 우선 장면 이면에 존재하는 역설로 나타난다. 사진 이미지는 특히 사회적 억압에 의해 감추어진 은밀한 존재를 역설적이고 풍자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탁월한 재현 매체가 된다. 예컨대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표현과 노출의 자유를 가지는 오늘날 여성의 몸,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억압에 의해 끝없이 만들어지고 상품화된 몸으로 전락한다. ● 또한 우리는 언제나 유토피아적인 미모에 길들어져 정상적인 외모를 이탈한 모든 여성의 몸 특히 뚱뚱한 몸과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의 배부른 몸에서 낯설고 이상한 모습을 발견한다. 그러나 임신은 여성의 육체적 아름다움이 모성의 아름다움으로 바뀌는 정상적인 과정이고 더구나 임산부의 몸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자연스런 형태들 중 하나가 아닌가? 거기서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가?
욕망 - 현실의 벽을 넘어
양재광_이혁_인효진展 2007_0912 ▶ 2007_0918

- 양재광_나이트 스위밍_디지털 프린트_30.5×40.1cm_2007

- 이혁_Untitled_디지털 프린트_40×50cm_2006

- 인효진_High School Lovers-Violet #02_디지털 프린트_35×27cm_2007
사진적 주제는 보이는 공간(le visible)의 문턱을 넘어 오히려 현실의 겹쳐진 주름에 은닉된 안 보이는 공간(l'invisible)에 존재한다. 특히 연극적 특징을 가지는 연출 사진은 바로 이러한 은밀한 존재를 암시하는 탁월한 재현방식으로 간주된다. 그것은 또한 작가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포착된 일종의 자기반향(自己反響)이기도 하다. 그때 이미지는 장면 그 자체의 기록이 아닌 "어떤 조짐을 호출하는" 자극-신호로 나타난다. ● "제한된 틀"이 보여주는 있음직한 연극적 상황은 심리적 표출로서 즉각적으로 또 다른 현실을 누설한다. 그것은 다만 이중으로 겹쳐진 현실의 이면에 존재할 뿐이다. 10대 소녀들의 억압된 성적 욕구와 관능, 불가능한 현실도피와 피안의 세계 등은 사진의 분명한 주제로서 인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의 상황적인 딜레마임과 동시에 오늘날 현실의 공통된 이탈을 암시한다. 결국 사진 이미지는 억압된 욕망과 감추어진 삶의 진실을 은밀히 들추어내는 또 다른 "인덱스 틀"이 된다.
기억 - 잃어버린 기억의 흔
김이정_심대원_이경민展 2007_0919 ▶ 2007_0925

- 김이정_그리운 것들은 하늘에 있다_디지털 프린트_50.8×40.6cm_2006

- 심대원_감성적 추상 프로젝트-숲_디지털 프린트_90×130cm_2007

- 이경민_일상의 바람 저 너머에_디지털 프린트_60×60cm_2006
사진은 언제나 기억의 은유로 간주된다. 사진에서 우리의 시계(視界)를 흐리게 하는 시각 효과는 영구히 지웠다가 다시 쓰는 기억의 팔렝프세스트(palimpseste) 양피지와 같이 언제나 불확실하고 모호한 레미니센스가 된다. 작가 자신이 경험한 불확실한 기억의 재현을 위해 그들은 각 매체의 영역을 가로질러 현실의 구체적인 존재를 확인하는 사실주의의 한계를 넘고 있다. ● 심하게 일그러지고 흐려진 도시의 거리와 시적 여운을 남기는 파스텔 색과의 조합은 보는 이로 하여금 더 이상 사진이 아닌 한 편의 서정시를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환영을 보는 듯 있음직한 현실과 불확실한 상황과의 결합은 한 폭의 추상화를 만든다. 이미지들은 작가 자신의 무의식에 부유하는 위장된 기억의 단편들이며 우리의 공통된 애환을 감추고 있다. 이때 장면은 단순한 빛의 기록을 넘어 삶의 은유로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우리 모두 잃어버린 기억의 흔적으로 이해된다.
일상 - 무의미의 재발견
김소현_김지원_안천호_전소정展 2007_0926 ▶ 2007_1002

- 김소현_봄은...갔다_디지털 프린트_27.5×35cm_2006

- 김지원_there are..._디지털 프린트_76×101cm_2007

- 안천호_Virtual Memory_디지털 프린트_40×60cm_2006

- 전소정_Hidden Files no.3_디지털 프린트_70×80cm_2007
사진 이미지가 암시하는 주제는 삶의 흔적이 머무는 모든 일상에 내재되어 있다. 잔잔히 물결치는 수면, 텅 빈 좁은 공간과 작은 개미들, 아무렇게나 놓인 머리핀과 충전기 코드, 화장실 거울에 붙은 면도기, 바닥에 남긴 책상다리 자국, 버려진 토마토 꼭지 등은 언제나 보는 같은 장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불현듯 이상한 인상(impression)을 가지게 한다. 일상의 자국들은 이제 더 이상 하찮은 존재가 아닌 새로운 의미의 발견이 된다. ● 작가들이 포착한 하찮은 것들은 단순한 오브제의 확인이 아니다. 일인칭 서술로 일상에 침수되는 순간 하찮은 모든 것들이 갑자기 각자의 기억으로 재생되는 특별한 경험을 한다. 우리는 사실상 일상이라는 상습적인 익숙함과 무의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집단 위선자의 위장된 이데올로기와 획일화된 가치에 길들려져 왔는가? 이처럼 삶의 진실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특별한 사건 순간이 아니라 "주체-자아"의 눈으로 바라 본 지속되고 반복되는 현재의 단면 속에 존재한다. 여기서 사진 읽기는 해석학적인 의미 부여가 아니라 언제나 또 그렇게 누구나 경험하는 상황으로부터 야기되는 각자의 기억에 있다. ■ 아트비트갤러리
Vol.20070905c | 사진의 쾌樂 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