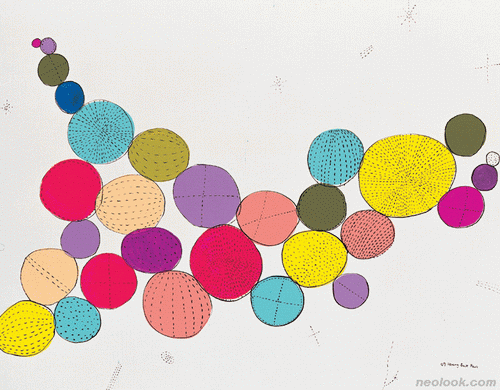- ● homepage
- ● archives
- ● restoration
- ● books
- ● big banners
- ● post board
- ■ neo's search
- ■ about us
- ■ 게재방법 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email protected]
- Tel. 02_335_7922
- Fax. 02_335_7929
- 10:00am~04:30pm
- 월요일~금요일
- 3/3(월) 대체공휴일

일기속의 풍경
박향숙 회화展 2007_0822 ▶ 2007_0904
●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학고재 홈페이지로 갑니다.
초대일시_2007_0822_수요일_05:00pm
학고재 서울 종로구 관훈동 100-5번지 Tel. 02_739_4937 www.hakgojae.com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나 주위에 대한 가장 재빠르고 직접적인 표현 수단이다. 이것을 어느 상황 속에 놓여진 존재, 정확하게는 현존재(Dasein)의 그래프라고 본다면 그 의미는 보다 확실해진다. 이것은 약간 오해를 일으키는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불안한 긴장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아이(아니, 어른이라도 그렇다) 의 그림에서는 그럴만한 징조가 보인다. 그것은 그야말로 마음의 그래프를 보는 것과 똑같은 심전도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박향숙은 긴장 관계가 없는 세계, 따뜻한 숨결로 사람도 물건도 감싸안고 어떠한 권력의 구성원리도 없이 모든 것이 평등해지는 특별한 장소, 마치 부드러운 모놀리스와 같은 몽상적인 세계를 그려내려고 하는지 모른다. 이런 의미로 그녀가 만들어 내는 비전은 약간 당돌하면서 가장 정확한 의미로써의 올오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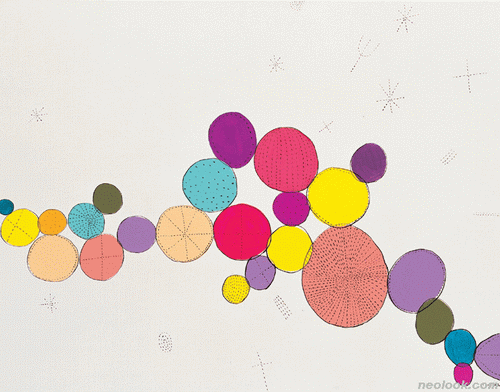
- 박향숙_비눗방울Ⅱ_캔버스에 아크릴채색_91×116.7cm_2007

- 박향숙_비눗방울 Ⅲ_캔버스에 아크릴채색_72.7×91cm_2007
박향숙의 독자적인 세계는 아득한 낙원의 기색을 남기는 혹은 상기시키는 그 곳을 향한「가까움」의 원리라고도 해야 할 것이다. 그 곳에는 사람도 물건도 공간도 서열화해 가고, 인간적인 듯 하나 비인간적이며, 그런 의미에서 서구적인 선원근법의 편린도 없다. 그 곳에서는 전경을 이루는 아이들도, 그 옆의 풀꽃에 물을 주고 있는 중천에 떠올라있는 물뿌리개도, 뒷면 벽과 같은 언덕도,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도, 신기루와 같은 교회와 수목도, 곳곳의 깜박이는 별까지도, 아동화풍의 바로 위에서 납작하게 그려진 화단도, 어쨌든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마치, 같은 평면 위에 있는 듯, 혹은 대지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운 것이다.

- 박향숙_비눗방울 놀이_종이에 마카_2007_부분
박향숙, 이 겸손하고 자기 주장이 적은 화가에게 있어서「가까움」이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지는 최근작의 비눗방울 시리즈를 봐도 잘 알 수 있다. 보통은, 혹은 전통적으로는 비눗방울은 무상함의 상징이다. 사실, 무지개의 파편과 같은 그것은 너무 섬세한 것이며, 태어나서 곧바로 터져 사라져 버린다. 적어도 우리 어른의 상식에서는 비눗방울은 그러한 것이라고 믿어 버리고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즐겁게 비눗방울을 불며 반짝반짝 한 눈으로 그것을 쫓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그 하나 하나가 세상에 둘도 없는 것, 즉 우열도 상하도 원근도 없이 동등하게 바로 옆에 제각기 선명하게 늘어서는 것은 아닌 것일까. 그러므로, 이 순수한 화가는 본래 구면(球面)이어야 할 비눗방울들 속에 최대한의「가까움」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빨강이나 파랑이나 노랑 등의 단색의 원판으로써 비눗방울들을 압축시키고 도려내는 한편, 거기에 불규칙한 층을 만들어, 빛나면서 갑자기 소멸하는 비눗방울 무리들의 약동감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그 곳에서는 모든 것이 일체가 되고 가지각색의 빛의 구름이 되어 마치 깜박이는 것 같다. 어쩌면 지성의 근거라고도 해야 할 분절화를 싫어하는 박향숙의 그림을 "소박파" 한마디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주기 바란다. 화가가 가슴에 꼭 껴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 이야말로, 우리의「근대」가 물질적 풍요의 환상에 쫓겨, 그 중심을 잃은 가치 체계로부터 추방시킨 것들은 아닐까. 그 결과, 우리는 과연 실로 행복하게 되었는가. 온 세상의 굶주려 가는 아이들의 영상을 앞에 두고 단지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포식을 행복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근대인의 정신은 오로지 내향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내가 굳이 현대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이 단어에서는 역사성이 결여된다, 즉 아직껏 우리는 근대의 선단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 박향숙_비눗방울 놀이_종이에 마카_2007_부분
박향숙의 예술의 최대의 매력은 이러한 음침하고 푸념이 많은 마음속에, 비록 소박하다지만, 아니 오히려 소박함에 철저함에 의해서, 일조의 빛을 비친 것에 있다. 길을 잃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은근히 비추어 준 것에 있다. 즉「회화의 대지」는 그 얼마나 유토피아라 말한다 하여도 결국은 이 살기 힘든 지상과 통하고 있다. 박향숙의 유토피아성 그 자체가, 혹은 만물에 대한 원초적일 만큼 가까운「가까움」그것이 실은 복잡 괴기한 현대 사회에 대해 비판이 되고 있다.

- 박향숙_저녁무렵_종이에 아크릴채색_66×58cm_2007
가혹한 현실에 작가 자신이 접하고 있기 때문이야말로 박향숙은 다음과 같은 실로 암시적인 몽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 밖에서 격하게 비가 내리는 날, 창 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의 집안의 따뜻함. 바깥 세상과는 격리되어 있는 적막함을 느끼게 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전술)

- 박향숙_푸른아침 Ⅲ_캔버스에 파스텔, 유채_116×91cm
박향숙이 꿈꾸는 가혹한 사회의 피난처 같은 장소, 이 비밀의 공간과도 같은「가까움」에 의해 유지된 농밀하고 따뜻한 회화를 보다 완벽한 모습으로 실현시키려면 현실과 회화를 준별하여 연관시켜주는 강인한 창의 존재가 꼭 필요할 것이다. 창은 회화의 숭고한 비유인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의외로 수수께끼 같은 표현이 되어 버렸지만, 「창」의 확정이야말로 화가로서의 지성이라고, 나는 제자에 대해 새로운 정진을 기대하는 바이다. ■ 모토에 쿠니오
Vol.20070825a | 박향숙 회화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