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page
- ● archives
- ● restoration
- ● books
- ● big banners
- ● post board
- ■ neo's search
- ■ about us
- ■ 게재방법 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email protected]
- Tel. 02_335_7922
- Fax. 02_335_7929
- 10:00am~04:30pm
- 월요일~금요일
- 3/3(월) 대체공휴일

Iron Drawing
유재중 조각展 2007_0321 ▶ 2007_0327
●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갤러리 각 홈페이지로 갑니다.
초대일시_2007_0321_수요일_06:00pm
갤러리 각 서울 종로구 관훈동 원 빌딩 4층 Tel. 02_737_9963 www.gallerygac.com
유재중의 재료는 철이다. 그의 작업실의 한쪽 구석에는 철을 달구는 화덕이 이글거리고 있고, 모루와 해머 등 두드려 형태를 만드는 도구들이 놓여 있다. 철 조각들이 가득 쌓여 있으며, 이미 만들어진 커다란 작품들이 우뚝 우뚝 서 있고, 바깥의 기온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다. 그러한 작업실의 풍경은 첫눈에 대단히 낯설다. 그의 작품이 철을 재료로 한다는 것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연한 작업실의 모습이 당황스러웠던 것은, 스스로도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 작품의 경향을 통해 어떤 작가의 작업실에는 큰 오디오가 있겠다든지 책이 많이 꽂혀 있겠다든지 정리벽이 있겠다든지 하는 점들을 떠올리고, 직접 작업실에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 그러한 소소한 짐작들이 맞고 틀리는 경험을 속으로 즐기기도 하는 감상자의 입장에서, 그의 작업실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혹은 당연히 그래야 할 모습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인상을 받은 이유, 그것은 그의 작업실이 현대미술가의 작업실이라기보다는 지난 시대 야장(冶匠)들이 일했던 거대한 대장간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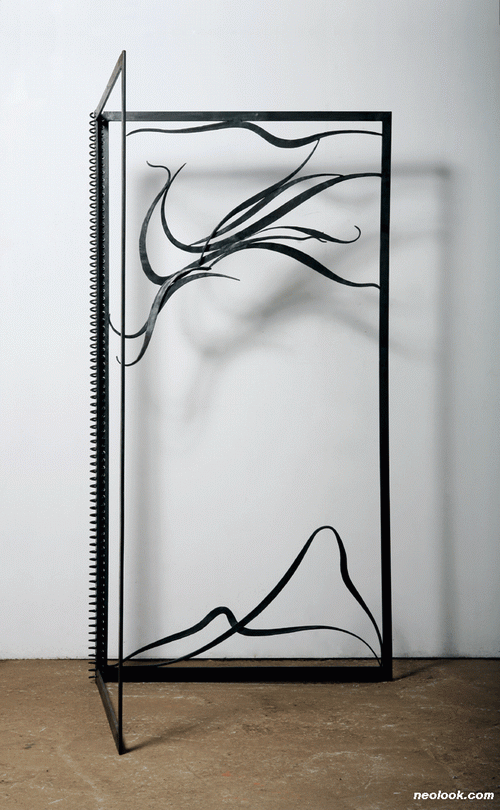
- 유재중_Iron Drawing_철_194×105×105cm_2007
이 낯설음에 대한 답은, 그가 자신의 작업실에 붙였던 '몸씀공방'이라는 타이틀이 일부 말해주고 있다. '몸씀'이라는 말은 작업을 하는 작가의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한 말이기도 하겠지만, 현대미술의 어떤 맥락에서는 대단히 반항적이고 냉소적인 표현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작품이다, 라는 아방가르드의 고지(高地)는 이미 많은 이들이 올라갔다 내려온 정복된 산이 되었지만, 그 정신의 기운은 도처에 산재해 있다. 그러한 가운데 '몸을 쓰겠다'는 그의 발언은 그 어떤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겠다는 역류(逆流)의 선언으로 들린다. 그러나 다른 한 편 죽음을 맞이한 시신이 아니라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몸 그 자체인 경우는 없다. 몸은 가슴과 머리와 교통하여 움직이고, 가슴과 머리도 몸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몸을 쓰겠다는 선언은 마음과 생각을 통째로 담아 그것을 몸으로 실현하겠다는 것으로, 비판적 관점과 지향의 지점이 더불어 담겨 있는 표현으로 보인다. ● 그의 작업을 처음 접했을 때, 어딘지 모르게 고대적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그 이유가 철이라는 재료 때문일까를 생각해 보았던 적이 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는 2005년 개인전 에서 자신의 작품이 빚어내는 형태를 고구려의 고분벽화 속 이미지와 연관시켜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작업실을 보는 순간 그의 작품이 '고대적'인 느낌을 담지한 이유에는 철이라는 재료가 주는 '철기시대'의 연상이 그 이유들 가운데는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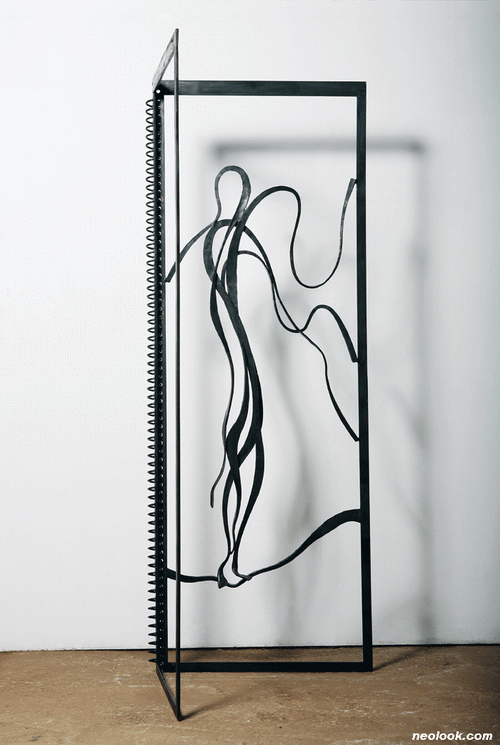
- 유재중_Iron Drawing_철_200×75×75cm_2007
오늘날 금, 은, 동의 순서로 금속이 가치가 매겨지는 가운데 철은 흔하디 흔하게 건물의 뼈대나 기계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철이 황금과 같은 가치를 가졌던 시대는, 그것이 무기로 만들어져 철 무기를 가지지 못한 이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때였고, 그러한 시대 이후에는 실용적인 재료의 가치 이상을 가지지 못했다. 물론 현대미술에서는 재료의 가치가 만들어진 것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치없는 재료들이 미술의 영역에 들어와 가치를 획득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철 작업의 경우에는 가치와 비가치의 사이 어중간한 영역을 점하고 있다. 어중간한 가치의 철로 만들어낸 그의 형태들은 맥락적으로 그 가치를 되짚어보게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것이 가치 있었던 시대를 연상시킨다. ● 그의 작품을 첫 눈에 바라보았을 때 발생하는 '고대적' 느낌은, 인상의 표피를 뚫고 작품을 자세히 바라볼수록 단순히 고대적 연상을 담은 애잔함이 덜어지는 반면 현대미술의 맥락을 건드리는 지점들을 발견하는 경험으로 전환된다.

- 유재중_Iron Drawing_철_53×77×42cm_2007
그의 작품은 사각의 형태를 한 기본 구조물과, 사각의 틀 안에 내용으로 자리하는 듯이 보이는 유기체적인 형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사각의 구조물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형태는 서 있는 노트의 형태이다. '스프링 제본'이 되어 있는 거대한 철 노트는 기본적으로 틀만으로 세워져 있어 외부의 풍경을 수용하고 있지만, 때때로 안쪽에 유기체적인 형상들이 달라붙어 있다. 역사의 시대와 함께 한 철을 재료로 하여 만든 거대한 노트, 본래 문자로 채워져 있어야 할 노트의 형상은 그 자체로 인간의 역사를 품고 있는 듯이 보이며, 또한 노트의 한쪽을 메워 나가고 있는 유기체적 형상들도 (2005년 개인전에서처럼 '고구려'를 직접 거론하는 정보 제공이 없다 하더라도) 보는 이로 하여금 신화적인 상상력을 동원하게끔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철이라는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유기체적인 형상들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성은 서로의 측면들을 더욱 북돋우며 그의 작품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사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좌대의 형태도 그의 작품 가운데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에게 있어 좌대는 입체 작품을 놓는 일반적인 기능을 넘어 그 자체의 기능과 형태를 의심하고 유희하는 실험의 대상이다. 좌대는 인간의 공간과 작품의 공간을 분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입체물로, 현대 미술에서 그것은 그대로 둘 것이냐 없앨 것이냐 양자 중의 택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다. 특히 레디메이드 오브제 등을 주로 사용하는 인스탈레이션의 경향은 인간의 공간에 침투하여 놓여질 목적으로 반드시 좌대를 없애는 형태를 취한다. 유재중의 좌대는 그 위에 작품이 얹혀 지기도 하지만 좌대의 안쪽에 작품이 놓여 지기도 하고 형상이 좌대의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뚫고 나오기도 한다. 즉 좌대를 버리거나 취하는 이분법적인 택일을 벗어나 있음으로 해서 어디까지가 작품이고 어디까지가 좌대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 유재중_Iron Drawing_철_43×45×54cm_2007
노트와 좌대 등의 틀 안에, 혹은 틀 위에 자리 잡고 있는 형상들, 그리고 틀 없이 바닥에 놓여 구불거리고 있는 유기체적 형상의 작품들을 바라보면, 그간 알지 못했던 철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온다. 하루아침 눈 깜짝할 새 땅을 파고 격자를 엮어 나가고 있는 건축물의 철골 뼈대를 바라볼 때 몰랐던, 그리고 아르누보적인 장식이 맥 빠지게 반복되고 있는 부유한 집의 철 대문을 바라볼 때 몰랐던, 생경한 아름다움이 있다. 그것은 철을 제련해 가장 효과적인 도구의 형태를 만들고자 했던 장인의 그것과도 다르고, 재료의 물성을 보여준다는 목적 아래 최소한의 조작만을 가해 관객에게 던져지는 어떤 것들과도 다르다. 날아가는 새 같기도, 물살에 흔들리는 물풀 같기도 한 그 형상들은, 도저히 힘으로는 어떻게 안될 것 같은 철 막대기가 인간의 의지를 만나 구부러지는, 즉 철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서로를 장악하려 하지 않고 '여기까지'라는 합의를 이루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 유재중_Iron Drawing_철_52×85×45cm_2007
그것은 '몸씀'을 표방하는 그의 몸의 의지와 한계, 그리고 철이 가진 속성의 의지와 한계가 만나, 인간의 몸과 철의 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순간을 굳힌 형태인 것이다. 아마도 그 양자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그가 주물(鑄物)의 방법을 거부하고 단조(鍛造)를 선택한 이유일지도 모르겠다.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미술은, 재료가 가진 속성과 인간의 의지가 만나는 장인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재료와 인간의 의지가 서로 낯설어하는 오늘, 몸의 힘을 사용하여 재료의 힘에 영향을 가하는 당연한 광경은 오히려 낯설다. 그것이 그의 작업실에서 받은 낯선 인상의 정체였다. 철과 그의 의지가 만나 만들어내는 다양한 바리에이션은, 그가 철의 속성에서 취하는, 그리고 철이 그의 기질에서 취하는, 서로에게 매혹된 순간들의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 화자(話者)는 작가 혼자가 아니고 '철과 작가'이다. ■ 이윤희
Vol.20070325b | 유재중 조각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