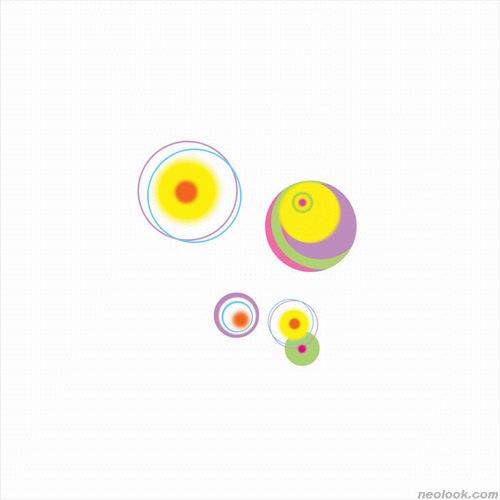- ● homepage
- ● archives
- ● restoration
- ● books
- ● big banners
- ● post board
- ■ neo's search
- ■ about us
- ■ 게재방법 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email protected]
- Tel. 02_335_7922
- Fax. 02_335_7929
- 10:00am~04:30pm
- 월요일~금요일
- 3/3(월) 대체공휴일

움직이는 그림 #2-버터빵
신소영 움직이는 그림展 2005_0321 ▶ 2005_0408 / 일요일 공휴일 휴관
●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문신미술관 빛 갤러리 홈페이지로 갑니다.
초대일시_2005_0321_월요일_05:00pm
문신미술관 빛 갤러리 공모 선정 전시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빛 갤러리 서울 용산구 효창원길 52번지 Tel. 02_710_9280 / 02_2077_7052 www.moonshin.or.kr
즐거운 슬픔, 경쾌한 절망, 가벼운 욕망 ● "나는 미디어 아티스트가 아니라 화가이다." 신소영은 강변한다. 그러나 그녀는 미디어 기술을 이용하며, 미디어 아트를 읽어내는 이론적 담론의 적용이 가능한 작품을 생산해내고 있다. 신소영은 미디어 아티스트이다. 그러나 동시에 손으로 붓을 들고 드로잉과 페인팅을 반복하는 전통적인 문맥 안에 있는 화가이다. ● 전통과 현대는 대립되는 요소이다. 대립은 갈등과 마찰을 불러일으키며 단절을 가져온다. 인간 삶이 수많은 단절 속에서 절충을 통해 공존의 길을 모색하듯 신소영은 단절과 공존을 작업의 기본개념으로 제시한다. 「버터빵」, 「일상」, 「Diary」, 「Pattern Poem」 등 이번 전시의 작품 제목들에서 알 수 있듯이 신소영이 추구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미디어 작업 자체가 작가와 엄마로서의 생활의 단절에 허기를 느끼며 공존의 해법으로 채택된 수단이었다. 인간 삶은 단절과 공존의 반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술이 당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삶을 화폭에 담는 것이라면 신소영의 미디어 작업 역시 미디어를 이용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의 작업이 미디어 아트라 지칭되지만 그다지 최첨단의 테크놀로지가 응용된 것도 아니며 공간과 시간을 점유하고자 하는 거창한 프로젝트도 아니다. 또한 그가 내세우는 단절과 공존이라는 작업 개념도 철학적 해석을 요하는 학문적인 용어라기보다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경험적 느낌이다. 신소영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조용히 들려준다. 미디어를 응용하는 작업 성격 때문에 혹자들은 신소영의 작품을 두고 라캉을 거론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작업은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을 토하는 넋두리이다. 그러나 이 넋두리는 한숨과 함께 토해지는 것이 아니라 천진한 어린아이의 즐겁고 경쾌한 깔깔거림으로 변형되어 흘러나온다. 원, 삼각형, 다이아몬드형 등의 기하학적 형태들은 추상 화가들의 세련된 것이라기보다 아동이 그린 서투른 무늬처럼 보여 지고, 빔 프로젝트로 투사되는 동영상의 원형들은 미디어 아트라기보다 즐거운 아동용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다. 실제로 그는 필자와의 대화 중에 애니메이션이라는 용어로 자신의 작품을 설명했다. 한번도 미디어 아트라는 어휘를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림의 소녀 형상이나 장갑 등을 보면 만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고 신소영은 아동을 위한 그림 전시회에 초대받기도 한다. 그럼 신소영의 작업은 애니메이션인가? 그는 삶의 무거운 중압감이 가벼움 안에 숨어드는 변형이나 위장이 바로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주체할 수 없는 인간 본능의 욕망을 가벼움으로, 슬픔을 즐거움으로, 절망을 경쾌함으로, 비관을 긍정적인 낙관으로 감추고 싶다고 말한다. 전쟁이나 잔혹한 살육 장면도 만화로 보면 그다지 심각하지 않듯이 질투와 욕망의 본능적 몸부림도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가벼운 유희가 된다. 우리들의 세상에는 밝음과 어두움이 늘 공존하고 있고, 신소영은 경쾌하고 가벼운 터치로 그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드러내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두 면이 드러난다기보다 어두움이 밝음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편이 더 옳을 것 같다. 라캉의 「도둑맞은 편지」에서 부재하는 편지는 누군가의 손에 분명히 존재하는 주체이듯이 신소영의 작업에서 부재된 어두움은 관람자가 찾아야 할 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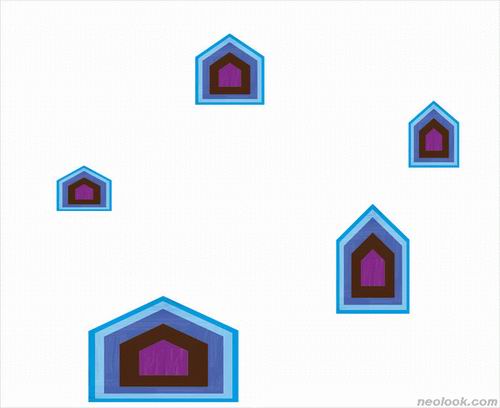
- 신소영_일상-0501_천에 디지털판화_100×80cm_2005

- 신소영_self-portrait-0401_천에 디지털판화_30×30cm_2005

- 신소영_self-portrait-0403_천에 디지털판화_30×30cm_2005
무거움을 가벼움으로, 어두움을 밝음으로, 부재를 존재로 교차시키고자 하는 신소영의 의도는 형식적인 면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2002년 개인전에 전시된 작품들에서 배경 역할을 했던 기하학적 형상들이 이번 전시에서는 주체로 등장한다. 정해진 틀 속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현대인의 모습은 실험실의 쥐나 다를 바 없다. 신소영은 이런 저런 틀에 짜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과연 개인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질문한다. 역설적으로 해답은 패턴이다. 집단의 틀 안에서 개인은 사라지고 규격화된 집단만이 남는다.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틀에 구속되면서 자아는 증발되어 버리고 그 자리에 패턴만 남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신소영은 역설한다. 하지만 신소영의 패턴은 규격화되어 있지도 않고 기계적이지도 않다. 신소영의 모든 작업이 그러하듯 드로잉하고 크레파스로 색칠하는 작업이 항상 우선된다. 손작업의 그림이 캄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판화나 회화로 출력되기도 하고 동영상의 이미지가 되기도 한다. 손작업과 기계 작업의 만남으로 패턴은 시성(詩性)으로 승화된다. 신소영은 이것을 「Pattern Poem」이라 명명한다. 구속의 답답함은 동심의 천진함으로 감추어져 있고 감미로운 시적 이미지는 아기 천사의 날개짓 같기도 하다. 그러나 패턴은 하루에도 몇번씩 곤두박질치며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현대인의 일상을 비추는 거울이다.

- 신소영_현기증이-나다_천에 디지털판화_100×80cm_2005

- 신소영_버터빵_애니매이션 이미지_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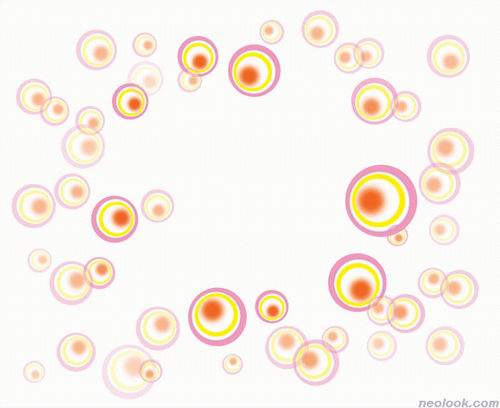
- 신소영_circle 0504_천에 디지털판화_100×80cm_2005

- 신소영_Diary-series_애니매이션 영상, 디지털판화_가변설치_2005
신소영이 즐겨 다루는 '거울', '불꽃', 기하학적 형상 등은 현실의 반영이다. 특히 작가는 거울을 통해 안과 밖의 두 가지 분리되는 자아를 연결시키고자 한다. 나르시스는 샘 위에 비추어진 자신을 타자로 인식했다. 그러나 신소영은 거울에 비친 모습이 타자, 다시 말해 내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은 없다. 그는 거울이 자아와 타자의 분리와 소외를 가져오는 틈새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신소영에게 있어 거울은 순간순간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도구이다. 그는 거울을 거울 밖의 '나'와 거울 안의 '나'를 분리시키면서 동시에 공존시키는 매개체로 간주한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자아의 내면이며 분열된 자아이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혹자는 '너는 누구인가?' 질문하며 정신분석학적인 게임을 즐기기도 하지만 신소영은 거울을 보며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서 있는지 묻는다. 그 물음은 메아리처럼 바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 신소영은 회화를 자연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한 르네상스 사람들처럼 지극히 전통적인 맥락 안에서 회화와 거울의 의미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의 예술은 자연이 아니라 현대인의 일상을 그리고 회의하고 갈등하는 자아를 비춘다. 신소영은 자신의 예술에게 질문한다. '나는 누구인가?' ■ 김현화
Vol.20050325b | 신소영 움직이는 그림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