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page
- ● archives
- ● restoration
- ● books
- ● big banners
- ● post board
- ■ neo's search
- ■ about us
- ■ 게재방법 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email protected]
- Tel. 02_335_7922
- Fax. 02_335_7929
- 10:00am~04:30pm
- 월요일~금요일
- 3/3(월) 대체공휴일

86학번 김대리
박영균展 / PARKYOUNGGYUN / 朴永均 / painting 2002_0214 ▶ 2002_0222
●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박영균 홈페이지로 갑니다.
초대일시_2002_0218_월요일_06:00pm
갤러리 헬로우아트 서울 강남구 청담동 82번지 K빌딩 Tel. 02_3446_4480
86학번 김대리가 제 이름을 부르며 우는 소리 ● 화가 박영균을 만났다. '그리워도 뒤돌아 보지 말자'던 '작업장 언덕길에 핀 꽃다지'의 그 서정을 더 이상 곱씹지 않는 386세대미술가를 만났다. 지난 시대의 강박을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느긋한 여유를 찾은 화가 박영균을 만난 것이다. 『민중미술15년전』(1994), 『가칭 삼백개의 공간전』(1997), 『두벌갈이전』(2001) 등의 기획전과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1997년과 1999년에 이어 세번째 개인전을 여는 서른 일곱의 박영균을, 전시 이력으로만 보자면 30대 중반의 여느 작가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10여년 전을 돌아보면 화가 박영균의 지금의 모습에는 우리 미술계의 소중한 역사 한 자락이 얽혀있음을 알게된다. ● 정형화된 노동자, 농민과 더불어 굵은 팔뚝을 내민 학생이 전면에 등장하는 「경희대 벽화」(경희대 쪽빛, 1989), 백두산을 배경으로 가슴에 태극기를 두른 김중기학형과 통일의 꽃 임수경학형이 등장하는 「외대 벽화」(서미련, 1990) 창작에 참여했으며, 저편에서 서성대는 백골단을 짱보면서 골목 모퉁이에서 벽보를 붙이고 있는 순간의 긴장을 포착한 「벽보 선전전」(1990)을 그린 현장미술운동 마지막 세대 박영균. 그에게 있어 1990년대는, 창작 승리의 원칙으로 현실비판적이고, 현장참여적인 정치선전미술을 거세게 밀고 나갔던 현장미술의 추억을 뒤로한 채, '86학번 김대리'의 비감한 일상을 그려내며 지난 시대에 대한 강박을 토로했던 기나긴 터널이었다.

- 박영균이 함께한 경희대 창작집단 쪽빛 제작_해방으로_경희대 벽화_1989
현장미술가 박영균이 경희대 벽화동아리 「쪽빛」 활동 이후, 「가는패」를 전신으로 하는 「서민미련」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수감생활을 한 지 딱 10년이 지났다. 가혹하리만치 냉엄하고 거칠게 자신을 내몰았던 현장미술 활동과 혹독한 수배생활을 경험한 조직미술운동가가 10년의 시간을 두고, 색깔 하나에 섬세하게 신경을 곤두세우며 붓질 하나하나에 영혼을 담아내려하는 그림쟁이로 살아남은 것 자체가 그리 흔치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화가 박영균을 만난 것이 내심 잔잔한 기쁨이었다. ● 첫번째 개인전 때 선보였던 「86학번 김대리」(1996)는 1980년대에 20대를 보낸 1960년대 출생의 30대, 이른바 386세대의 정체성을 담은 대표적인 작품이 되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경희대 벽화」가 있다. 우악스러운 인상과 굵은 팔뚝이 인상적인 이 벽화는 수많은 80년대 벽화들 가운데 드물게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는 지난 시대의 유물로 남아있다. '잡은 손 놓지 못하는 청년의 의리'로 똘똘 뭉쳤던 청춘의 강렬한 기억은 평생을 지배한다고 했다. 1990년대의 박영균은 프로파간다의 짜릿함을 잊지 못하는 열정과 강박으로 가득 차 있다. 노래방에서 야동을 배경으로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 샛바람에 떨지 마라'를 불러대는 김대리의 모습조차도 일견 정형화된 형상을 벗어난 유머를 가지고 있는 듯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숨어있는 비감한 정서를 감출 수는 없었다.

- 박영균_너나_캔버스에 아크릴채색_193×180cm_2001
그의 첫번째 개인전이 일러스트적인 묘사와 만화식 구성, 초현실적인 화면구성과 색채, 먹그림의 방법과 그 분위기, 걸개그림식의 인물배치 등 풍부한 회화적 실험에 심취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일상, 권력, 욕망, 분단' 등 여러 가지 주제들을 잡다하게 벌여놓았다는 점에서, 현장미술의 추억이 1990년대의 다원화된 미술흐름으로 전이하는 과정과 함께 30대 초반 젊은 작가의 의지의 과잉이 여과 없이 드러나 보인다. 부천에서 조용히 치뤘다는 두번째 개인전은 주변의 산천초목과 어머니가 옥상에서 스티로폼 박스에 길러낸 화초와 야채들을 그려냈다. 자신이 접하는 풀꽃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 (사생)화가의 면면은 이전의 현장미술활동가나 386세대미술가의 면모를 지워낸 새로운 모색이나 일대 실험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젊은 박영균이 한큐에 강요배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80년대 말에 불끈 쥔 주먹과 억센 팔뚝을 내밀거나, 백골단의 동태를 살피며 벽보를 붙이던 청년은 90년대 중반 들어 노래방에서 메마른 민중가요를 부르고 있었다. 이후 풀꽃에 담긴 서정을 담으면서 그림 그리는 사람의 성긴 마음을 달래보기도 했지만, 성에 찰리 만무했다.

- 박영균_베란다에서_캔버스에 아크릴채색_145×126cm_2002
이번 전시에서 화가 박영균을 다시 만나는 즐거움이 배가되는 것은 이러한 10년의 곡절들을 담아 유연하게 풀어헤친 후 차곡차곡 정리해낸 살뜰한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짧지 않은 시간동안의 실험과 모색이 한결 여유있고 자신감있는 화가 박영균을 낳은 것이다. 그는 그림 속에 '86학번 김대리'라는 분신을 확고하게 심어두고 있으면서도 예의 그 강박을 떨쳐내고 있는데,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텅 빈 들길을 걸으며 「잠수」 탈 생각을 하다가도, 아파트 거실의 소파에 앉아 게으른 백수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는 일상인의 모습을 담아낸 것이 그것이다. 때로는 욕실 거울 앞에서 「탕, 거울 속에 입으로만」 손가락 총질을 해보기도 하고, 「이번 생」에서는 친구들이 돌아간 술자리에 소주병을 옆에 두고 엎어져 잠든 지친 생활인으로서의 따뜻함이 묻어나기도 한다. ● 하지만 그냥 멜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묘미를 더해준다. 그렇게 침잠해들어가는 일상인의 이면에 숨겨진 섬짓함을 새겨볼 필요가 있다. 「노란 바위가 보이는 풍경」에 등장하는 김대리는 신록을 배경으로 한 노란 바위 위에 휑하니 서서 이렇게 중얼거린다. "난 나를 모욕한 자를 늘 관대히 용서해 주었지. 하지만 내겐 명단이 있어……" 「살찐 소파에 대한 일기I, II」나, 「파란 나무 아래서」에 등장하는 팔을 괴고 누워있는 김대리 또한 생각이 많은 인물로 보인다. ● 특히 「살찐 소파에 대한 일기I」은 한가롭고 게을러 보이는 거실 풍경이다. 가운데 아래쪽의 거실바닥은 노란 선 격자무늬로 단순화게 처리되어 있다. 왼쪽에는 '난닝구'에 '사각 빤쓰'만 걸치고 소파 위에 누운 인물이, 오른쪽에는 텅빈 텔레비젼이 배치되어 있다. 묘하게도 이 그림의 마지막 눈길이 오래 머무는 곳은, 과감하게 단순화된 노란 바닥도, 아무런 이미지 없이 하얗게 비어 있는 텔레비젼도, 미묘한 붓질로 그림쟁이로서의 재미를 한껏 구가해낸 인물도 아니다. 희뿌연 실루엣으로 드러난 아파트 베란다 너머의 그 무엇이다. 박영균이 여유를 찾았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장치들을 읽어본 후의 생각이었다. 빠다 좀 발라서 얘기하자면, 작가는 이제 텅빈 그 무엇을 통해 이야기를 건내고 있는 것이다. ● 강변하지 않아도 들리게 하는 회화의 맛을 찾아낸 박영균은 「노란 바위가 보이는 풍경」, 「파란 나무가 보이는 풍경」, 「파란 나무 아래서」 등의 작품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파란색, 노란색 등 원색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형광색에 가까운 야사시한 미색들까지 가미되어 있다. 이러한 '명랑 색깔'과 더불어 두텁게 바르기, 옅게 바르기, 긁어내기, 꼬물꼬물 잔붓질, 대담하고 명쾌한 큰붓질 등등을 하나하나 읽어내도록 물감과 붓의 맛을 기분 좋게 엮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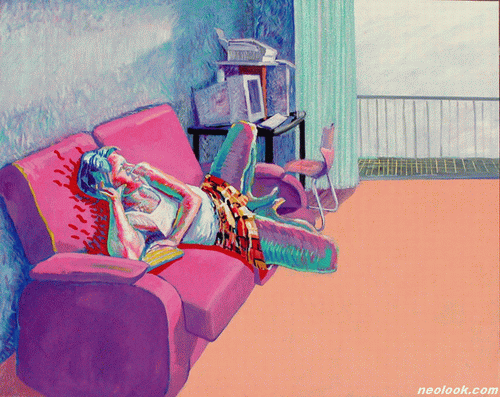
- 박영균_살찐 소파에 대한 일기 Ⅱ_캔버스에 아크릴채색_130×162cm_2001
이러한 박영균의 그림들은 예의 날카로움을 넘어서, 상식과 식상의 경계를 넘나들게 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강한 원색으로 한숨에 그어낸 굵은 선들과 촘촘하게 찍힌 무수한 점들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표현주의나 신인상파 따위의 유럽 옛그림들을 상상하게 한다거나, '영혼을 담은 듯한 심연의' 색채와 텃취, 그리고 들판, 강가, 나무 아래에서 부유 내지는 부랑하는 인물들의 낭만적인 서정에서 안창홍이나 최민화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 최민화라는 이름이 나왔다. 이 이름은 80년대 이래 민중미술의 역사에 풍운아로 기억되고 있는 화가 최민화의 이름이거니와 김형경의 장편소설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면 운다』(1993)에 등장하는 다섯명의 청년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했다. 졸업 후 위장취업을 한 최민화, 태백탄광촌에 들어간 민형조, 명상센터 운영자가 된 김시현, 미술잡지 기자 진은혜, 미술교사 구운형 등이 얽어내는 좌절과 환멸을 그려낸 이 소설은 80년대 팔아먹는 뻥튀기 소설들과는 격이 다르다는 평을 받았다. 박영균과 같은 대학인 경희대 국문과를 나온 김형경이 쓴 이 소설은 벽화운동를 통해 사회변혁을 꿈꾸었던 「민주시화회」라는 미술동아리 동기생들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화가 박영균의 청춘 이야기와 닮아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소설의 주인공들은 좌절과 환멸을 상처와 이별로 마무리했지만, 박영균은 10여년의 여정 끝에 제 몫의 삶을 찾아내기 시작했다는 점일 것이다. ● 새들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운다고 했다. 딱다구리는 '딱따구르르' 하고, 부엉이는 '부엉부엉' 하고……. 86학번 김대리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우는 소리를 딱 떨어지는 의성어로 만들 수는 없을까 잠시 어처구니없는 상상을 해보았다. 대신 우리에게는 화가 박영균이 제 이름을 부르며 붓질한 그림들을 마주함으로써 그 소리를 들을 기회가 주어졌다. 그것은 낙관이나 비관 양자 모두가 쓰잘 데 없는 것이라는 점을 깨우친 사람의 차분한 이야기이자, 386세대의 강박을 넘어서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여유있게 흐느적거리는 콧노래소리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86학번 김대리가 제 이름을 부르며 우는 소리'일 것이다. ■ 김준기
Vol.20020213a | 박영균展 / PARKYOUNGGYUN / 朴永均 / painting

